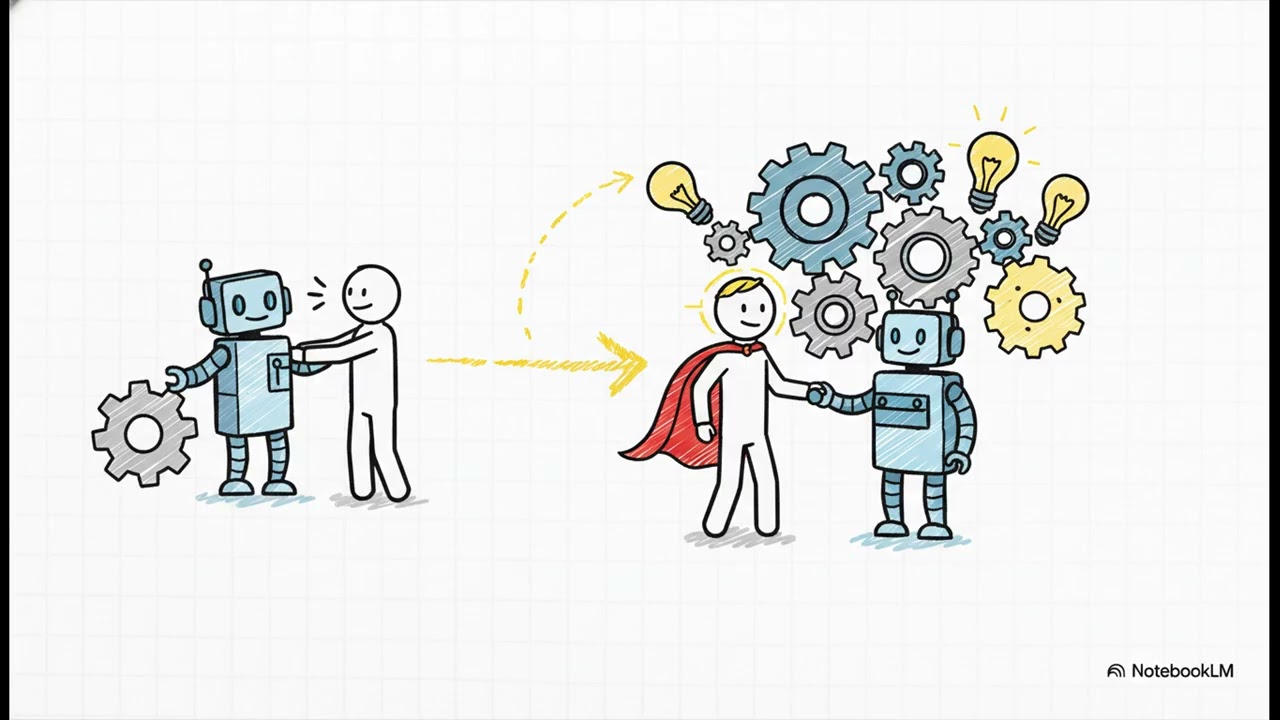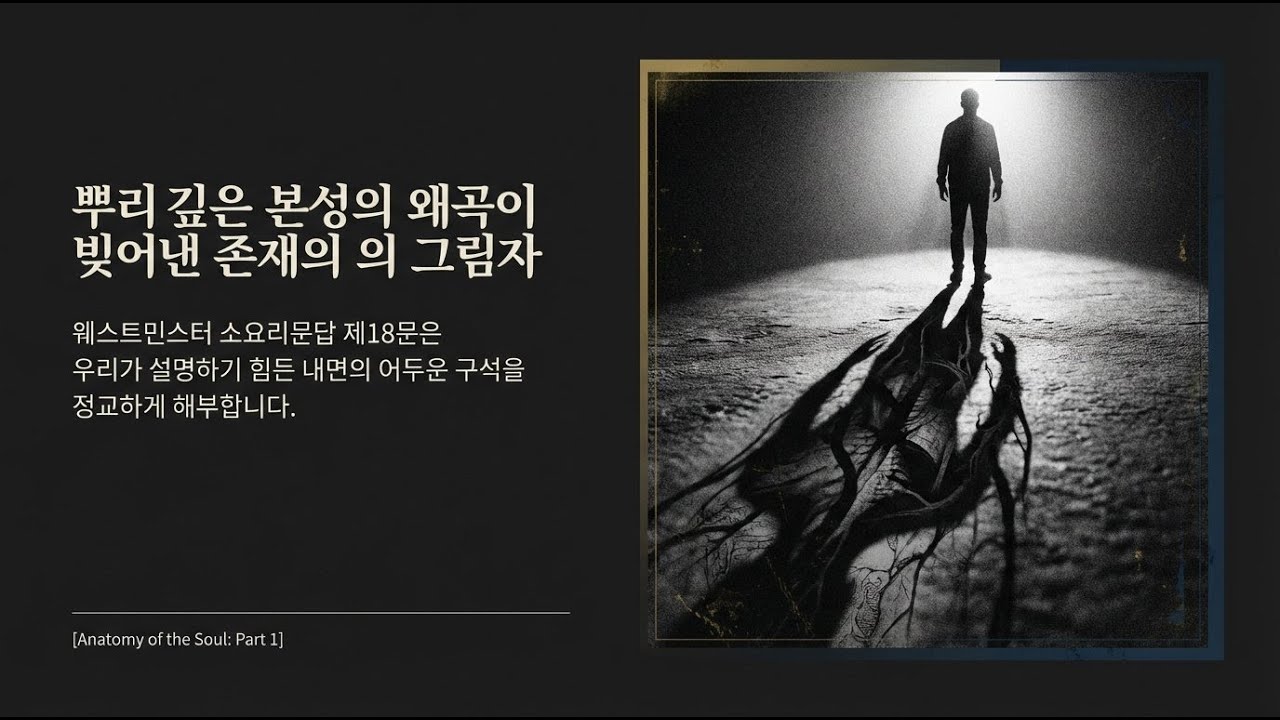AIк°Җ мғҒмң„ 10%лҠ” лӘ» л„ҳлҠ” мқҙмң вҖҰ вҖҳнҸүк· вҖҷм—җ к°ҮнһҢ көҗмӢӨмқҳ 비극
л¶Ҳкіј 2, 3л…„ м „л§Ң н•ҙлҸ„ көҗл¬ҙмӢӨ н’ҚкІҪмқҖ мӮ¬лӯҮ лӢ¬лһҗлӢӨ. көҗмӮ¬л“ӨмқҖ мұ—GPTлӮҳ м ңлҜёлӮҳмқҙ(Gemini) к°ҷмқҖ лІ”мҡ© AI м•һм—җм„ң лЁёлҰ¬лҘј мӢёл§Өкі н”„лЎ¬н”„нҠёлҘј лӢӨ듬лҠҗлқј 분주н–ҲлӢӨ. м–ҙл–»кІҢ м§Ҳл¬ён•ҙм•ј AIк°Җ көҗмңЎкіјм •м—җ л§һлҠ” лӢөліҖмқ„ лӮҙлҶ“мқ„м§Җ кі лҜјн•ҳлҚҳ вҖҳн”„лЎ¬н”„нҠё м—”м§ҖлӢҲм–ҙл§ҒвҖҷмқҳ мӢңлҢҖмҳҖлӢӨ. к·ёлҹ¬лӮҳ м§ҖкёҲ, к·ё мӢңм ҲмқҖ л§Ҳм№ҳ нқ‘л°ұмҳҒнҷ”мІҳлҹј м•„л“қн•ҳкІҢ лҠҗк»ҙ진лӢӨ. 2026л…„мқҳ көҗмӢӨмқҖ лҚ” мқҙмғҒ AI мӢӨн—ҳмӢӨмқҙ м•„лӢҲлӢӨ. н•ҷмҠө лӘ©н‘ңмҷҖ нҸүк°Җ л…јлҰ¬к°Җ мҷ„лІҪн•ҳкІҢ лӮҙмһҘлҗң вҖҳкөҗмңЎ м „мҡ© AI н”Ңлһ«нҸјвҖҷмқҙ көҗмӢӨмқҳ мқён”„лқјлЎң көікұҙнһҲ мһҗлҰ¬ мһЎм•ҳкё° л•Ңл¬ёмқҙлӢӨ.
мқҙ ліҖнҷ”лҠ” н‘ңл©ҙм ҒмңјлЎң л§Өмҡ° м„ұкіөм ҒмқҙлӢӨ. мҠӨнғ нҚјл“ң лҢҖн•ҷ SCALE мқҙлӢҲм…”нӢ°лёҢ(Stanford Center for Assessment, Learning and Equity)к°Җ 2025л…„ 12мӣ” л°ңн‘ңн•ң м—°кө¬ ліҙкі м„ңм—җ л”°лҘҙл©ҙ, көҗмңЎ м „мҡ© AI н”Ңлһ«нҸј(SchoolAI)мқ„ лҸ„мһ…н•ң көҗмӮ¬мқҳ м Ҳл°ҳ мқҙмғҒмқҙ мҙҲкё° 3к°ңмӣ” лӮҙм—җ мӢңмҠӨн…ңм—җ м•Ҳм°©н–ҲлӢӨ. м—°кө¬м§„мқҖ AIк°Җ мЈјлӢ№ 5мӢңк°„м—җм„ң 10мӢңк°„м—җ лӢ¬н•ҳлҠ” н–үм • м—…л¬ҙмҷҖ мҲҳм—… мӨҖ비 мӢңк°„мқ„ лҚңм–ҙмЈјм—Ҳкё° л•Ңл¬ёмқҙлқјкі 분м„қн–ҲлӢӨ. көҗмӮ¬л“ӨмқҖ мқҙм ң AIлҘј к°җлҸ…н•ҳлҠҗлқј 진мқ„ л№јлҠ” лҢҖмӢ , мӢңмҠӨн…ңмқҙ м ңкіөн•ҳлҠ” мөңм Ғнҷ”лҗң кІҪлЎңлҘј л”°лқј мҲҳм—…мқ„ 진н–үн•ңлӢӨ. л°”м•јнқҗлЎң нҡЁмңЁм„ұмқҳ мҠ№лҰ¬лӢӨ.

к·ёлҹ¬лӮҳ мқҙ л§ӨлҒ„лҹ¬мҡҙ нҡЁмңЁм„ұмқҳ мқҙл©ҙм—җм„ң, мҡ°лҰ¬лҠ” көҗмңЎмқҳ к°ҖмһҘ ліём§Ҳм Ғмқё к°Җм№ҳмқё 'мғҒмғҒл Ҙ'мқҙ мЎ°мҡ©нһҲ мӢӨмў…лҗҳкі мһҲлҠ” кІғмқҖ м•„лӢҢм§Җ л¬јм–ҙм•ј н•ңлӢӨ. м§ҖлӮң 1мӣ” 25мқј, көӯм ңн•ҷмҲ м§Җ гҖҠмӮ¬мқҙм–ёнӢ°н”Ҫ лҰ¬нҸ¬нҠё(Scientific Reports)гҖӢм—җ кІҢмһ¬лҗң лӘ¬нҠёлҰ¬мҳ¬ лҢҖн•ҷкөҗ м—°кө¬м§„мқҳ л…јл¬ёмқҖ мқҙ мӢңм җм—җ л¬өм§Ғн•ң кІҪмў…мқ„ мҡёлҰ°лӢӨ. м№ҙлҰј м ңлҘҙ비(Karim Jerbi) көҗмҲҳнҢҖмқҙ 10л§Ң лӘ…мқҳ мқёк°„кіј мөңмӢ AI лӘЁлҚё(GPT-4 л“ұ)мқҳ м°Ҫмқҳм„ұмқ„ 비көҗн•ң кІ°кіј, AIлҠ” мқҙм ң 'нҸүк· м Ғмқё мқёк°„'мқҳ м°Ҫмқҳм„ұмқ„ лҠҘк°Җн–ҲлӢӨ. лҲ„кө¬лӮҳ AIмқҳ лҸ„мӣҖмқ„ л°ӣмңјл©ҙ к·ёлҹҙл“Ҝн•ң м—җм„ёмқҙлҘј м“°кі , мӨҖмҲҳн•ң к·ёлҰјмқ„ к·ёлҰ¬л©°, л¬ём ң н•ҙкІ°мұ…мқ„ лӮҙлҶ“мқ„ мҲҳ мһҲкІҢ лҗҳм—ҲлӢӨлҠ” лң»мқҙлӢӨ.
н•ҳм§Җл§Ң м—¬кё°м—җлҠ” м№ҳлӘ…м Ғмқё н•Ём •мқҙ мһҲлӢӨ. мғҒмң„ 10%мқҳ мқёк°„, мҰү к°ҖмһҘ м°Ҫмқҳм Ғмқё мқёк°„мқҖ м—¬м „нһҲ AIлҘј м••лҸ„м ҒмңјлЎң м•һм„ лӢӨ. мқҙкІғмқҙ көҗмңЎ нҳ„мһҘм—җ мӢңмӮ¬н•ҳлҠ” л°”лҠ” 섬лң©н•ҳлӢӨ. AI лҸ„кө¬к°Җ м•„мқҙл“Өм—җкІҢ мҶҗмүҪкІҢ вҖҳнҸүк· мқҙмғҒмқҳ кІ°кіјл¬јвҖҷмқ„ мҘҗм—¬мӨ„ л•Ң, кіјм—° м•„мқҙл“ӨмқҖ к·ё мқҙмғҒмқҳ кі нҶөмҠӨлҹ¬мҡҙ мӮ¬мң лҘј мӢңлҸ„н•ҳл Ө н• к№Ң? 2025л…„ л§җ мқён…ҢлҰ¬м–ҙ л””мһҗмқё м—…кі„м—җм„ң лӮҳмҳЁ "мҡ°лҰ¬к°Җ м§ҖкёҲ AI мӮ¬мҡ© л°©мӢқмқ„ мһ¬кі н•ҳм§Җ м•Ҡмңјл©ҙ, мқёк°„мқҳ м°Ҫмқҳм„ұмқҖ 2027л…„к№Ңм§Җ м •мІҙлҗ (flatline) кІғ"мқҙлқјлҠ” кІҪкі лҠ” кІ°мҪ” кіјмһҘмқҙ м•„лӢҲлӢӨ. мҡ°лҰ¬к°Җ м•„мқҙл“Өм—җкІҢ к°ҖлҘҙм№ҳлҠ” кІғмқҙ вҖҳнҸүк· м—җ лҸ„лӢ¬н•ҳлҠ” кё°мҲ вҖҷмқҙлқјл©ҙ, мҡ°лҰ¬лҠ” кІ°көӯ кё°кі„ліҙлӢӨ лӘ»н•ң мқёк°„мқ„ кё°лҘҙкІҢ лҗ кІғмқҙлӢӨ.
'AI л””м§Җн„ёкөҗкіјм„ң 2л…„ м°Ё', н•ңкөӯ көҗмӢӨмқҳ л”ңл Ҳл§Ҳ
мқҙлҹ¬н•ң м „ м„ёкі„м Ғ нқҗлҰ„мқҖ н•ңкөӯ көҗмңЎ нҳ„мһҘм—җм„ңлҸ„ нҳ„мһ¬м§„н–үнҳ•мқҙлӢӨ. 2025л…„ мҲҳн•ҷВ·мҳҒм–ҙВ·м •ліҙ көҗкіјм—җ AI л””м§Җн„ёкөҗкіјм„ң(AIDT)лҘј мӢңлІ” лҸ„мһ…н•ң н•ңкөӯмқҖ, лӢӨк°ҖмҳӨлҠ” 3мӣ”л¶Җн„° мҙҲл“ұ 5~6н•ҷл…„кіј мӨ‘2, кі 2к№Ңм§Җ к·ё м Ғмҡ© лІ”мң„лҘј нҷ•лҢҖн•ңлӢӨ. м •л¶ҖлҠ” мқҙлҘј "н‘ңмӨҖнҷ”лҗң көҗмңЎм—җм„ң к°ңмқё л§һм¶Өнҳ• көҗмңЎмңјлЎңмқҳ лҢҖм „нҷҳ"мқҙлқј мҳҲкі н–Ҳм§Җл§Ң, нҳ„мһҘмқҳ кіөкё°лҠ” мӮ¬лӯҮ ліөмһЎн•ҳлӢӨ. м§ҖлӮң 1л…„, көҗмӮ¬л“ӨмқҖ AI нҠңн„°к°Җ 분м„қн•ҙ мӨҖ н•ҷмғқл“Өмқҳ 'мҳӨлӢө нҢЁн„ҙ' лҚ•л¶„м—җ к°ңлі„ м§ҖлҸ„мқҳ нҡЁмңЁм„ұмқ„ л§ӣліҙм•ҳм§Җл§Ң, лҸҷмӢңм—җ нғңлё”лҰҝ нҷ”л©ҙ мҶҚм—җ к°ҮнҳҖлІ„лҰ° м•„мқҙл“Өмқҳ мӢңм„ мқ„ лӢӨмӢң көҗмӮ¬мҷҖмқҳ лҲҲл§һм¶ӨмңјлЎң лҸҢлҰ¬лҠ” лҚ° лҚ” л§ҺмқҖ м—җл„Ҳм§ҖлҘј мҸҹм•„м•ј н–ҲлӢӨ.
нҠ№нһҲ 2026л…„ 3мӣ” н•ҷкё°л¶Җн„° ліёкІ©нҷ”лҗ AI көҗкіјм„ң нҷ•лҢҖ м Ғмҡ©мқ„ м•һл‘җкі , нҳ„мһҘм—җм„ңлҠ” 'л§һм¶Өнҳ• н•ҷмҠө'мқҙлқјлҠ” лӘ…분 м•„лһҳ м•„мқҙл“Өмқҳ мӮ¬кі кіјм •мқҙ нҢҢнҺёнҷ”лҗҳлҠ” кІғмқ„ мҡ°л Өн•ҳкі мһҲлӢӨ. AIк°Җ мөңм Ғмқҳ н•ҷмҠө кІҪлЎңлҘј м ңмӢңн•ҳкі мң мӮ¬ л¬ён•ӯмқ„ лҒҠмһ„м—Ҷмқҙ 추мІңн•ҙ мӨ„ л•Ң, м•„мқҙл“ӨмқҖ 'л¬ём ңлҘј н•ҙкІ°н•ҳлҠ” нһҳ'мқ„ кё°лҘҙлҠ”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мң нҳ•мқ„ м•”кё°н•ҳлҠ” нҢЁн„ҙ'мқ„ н•ҷмҠөн•ҳкІҢ лҗ м§Җ лӘЁлҘёлӢӨ. кіјлӘ© лҸ„мһ… мӢңкё°к°Җ мЎ°м •лҗң көӯм–ҙмҷҖ мӮ¬нҡҢ көҗкіј л…јмҹҒм—җм„ң ліҙл“Ҝ, л¬ён•ҙл Ҙкіј 비нҢҗм Ғ мӮ¬кі к°Җ н•„мҲҳм Ғмқё мҳҒм—ӯк№Ңм§Җ AIмқҳ нҡЁмңЁм„ұ л…јлҰ¬к°Җ мһ мӢқн• л•Ң мҡ°лҰ¬к°Җ мһғкІҢ лҗ кІғмқҖ лӢЁмҲңн•ң 'мў…мқҙ көҗкіјм„ң'к°Җ м•„лӢҲлқј, н–үк°„мқ„ мқҪкі л§ҘлқҪмқ„ мӮ¬мң н•ҳлҠ” 'мқёк°„м Ғ мӢңк°„'мқј мҲҳ мһҲлӢӨ.
вҖңнҳ‘м—…мқҙ м•„лӢҲлқј лІ лҒјлҠ” кІғвҖқвҖҰ кіјм •мқҙ мғқлһөлҗң вҖҳмӣҗнҒҙлҰӯ мҲҳм—…вҖҷмқҳ н•Ём •
STEM(кіјн•ҷВ·кё°мҲ В·кіөн•ҷВ·мҲҳн•ҷ) көҗмңЎ нҳ„мһҘм—җм„ң лІҢм–ҙм§ҖлҠ” ліҖнҷ” м—ӯмӢң мқҙмӨ‘м ҒмқҙлӢӨ. мқёлҸ„мҷҖ м•„н”„лҰ¬м№ҙ л“ұ мӢӨн—ҳ мӢӨмҠө мһҘ비к°Җ л¶ҖмЎұн–ҲлҚҳ м§Җм—ӯм—җм„ң AI кё°л°ҳ мӢң뮬л Ҳмқҙм…ҳмқҖ нҳҒлӘ…м Ғмқё лҸ„кө¬лӢӨ. м•„мқҙл“ӨмқҖ мң„н—ҳн•ң нҷ”н•ҷ м•Ҫн’Ҳ лғ„мғҲлҘј л§Ўкұ°лӮҳ 비мӢј мһҘ비лҘј к№ЁлңЁлҰҙ кұұм • м—Ҷмқҙ к°ҖмғҒ нҷҳкІҪм—җм„ң л¬јлҰ¬ лІ•м№ҷмқ„ мӢӨн—ҳн•ңлӢӨ. м ‘к·јм„ұмқҳ мёЎл©ҙм—җм„ңлҠ” 분лӘ…н•ң 진ліҙлӢӨ. к·ёлҹ¬лӮҳ нҳ„мӢӨмқҳ л¶Ҳнҷ•мӢӨм„ұкіј вҖҳл§Ҳм°°вҖҷмқҙ кұ°м„ёлҗң л§ӨлҒ„лҹ¬мҡҙ мӢң뮬л Ҳмқҙм…ҳ мҶҚм—җм„ң м•„мқҙл“ӨмқҖ мӢӨнҢЁлҘј нҶөн•ҙ л°°мҡ°лҠ” лІ•мқ„ мһҠм–ҙк°Җкі мһҲлӢӨ.
нҒҙлҰӯ н•ң лІҲмңјлЎң мҙҲкё°нҷ”лҗҳлҠ” мӢӨн—ҳ мҶҚм—җм„ң, мҳҲмғҒм№ҳ лӘ»н•ң ліҖмҲҳк°Җ л§Ңл“Өм–ҙлӮҙлҠ” мҡ°м—°н•ң л°ңкІ¬мқҳ кё°нҡҢлҠ” мӮ¬лқјм§„лӢӨ. мҪ”л„ӨнӢ°м»· лҢҖн•ҷкөҗ көҗмңЎмӢ¬лҰ¬н•ҷкіј м ңмһ„мҠӨ м№ҙмҡ°н”„л§Ң(James C. Kaufman) көҗмҲҳк°Җ м§ҖлӮң 1мӣ” л°ңн‘ңн•ң м—°кө¬м—җм„ң м§Җм Ғн–Ҳл“Ҝ, "кіјм ңмқҳ лӘ©н‘ңлҠ” мөңмў… мӮ°м¶ңл¬јмқҙ м•„лӢҲлқј к·ё мһ‘м—…мқ„ мҲҳн–үн•ҳлҠ” кіјм •мқ„ л°°мҡ°лҠ” кІғ"мқҙлӢӨ. к·ёлҹ¬лӮҳ м§ҖкёҲ м•„мқҙл“ӨмқҖ AIмҷҖ нҳ‘м—…н•ңлӢӨкі лҜҝм§Җл§Ң, мӢӨмғҒмқҖ мһҗмӢ мқҳ мӮ¬кі кіјм •мқ„ кё°кі„м—җ мң„нғҒн•ҳлҠ” 'мқём§Җм Ғ мҷёмЈјнҷ”(Cognitive Outsourcing)'лҘј кІӘкі мһҲлӢӨ.
AIк°Җ мҚЁмӨҖ кёҖмқ„ лӢӨ듬мңјл©° мһҗмӢ мқҙ мҚјлӢӨкі м°©к°Ғн•ҳкі , AIк°Җ н’Җм–ҙмӨҖ л¬ём ңмқҳ л…јлҰ¬лҘј мқҙн•ҙн–ҲлӢӨкі кіјмӢ н•ңлӢӨ. мһҗкё° нҡЁлҠҘк°җмқҖ лҶ’м•„м§Җм§Җл§Ң, мӢӨм ң нҷҖлЎң м„°мқ„ л•Ңмқҳ л¬ём ң н•ҙкІ° лҠҘл ҘмқҖ кІҖмҰқлҗҳм§Җ м•ҠмқҖ мғҒнғңлЎң лӮЁлҠ”лӢӨ. мқҙлҠ” көҗмңЎмқҳ лҜјмЈјнҷ”к°Җ м•„лӢҲлқј, вҖҳмғҒмғҒл Ҙмқҳ н•ҳн–Ҙ нҸүмӨҖнҷ”вҖҷлЎң мқҙм–ҙм§Ҳ мң„н—ҳмқҙ нҒ¬лӢӨ. 진м§ң л°°мӣҖмқҖ л§ӨлҒ„лҹ¬мҡҙ м„ұкіөмқҙ м•„лӢҲлқј, кұ°м№ кі нҲ¬л°•н•ң мӢӨнҢЁмқҳ кіјм • мҶҚм—җ мҲЁм–ҙ мһҲлӢӨ.
м •лӢө мһҗнҢҗкё°к°Җ лҗң AI, мқҙм ңлҠ” вҖҳкІҪмқҙ(Wonder)вҖҷлҘј к°ҖлҘҙм№ мӢңк°„
к·ёл ҮлӢӨл©ҙ мҡ°лҰ¬лҠ” м–ҙл””лЎң лӮҳм•„к°Җм•ј н•ҳлҠ”к°Җ. лӢЁмҲңнһҲ кё°мҲ мқ„ кұ°л¶Җн•ҳкі кіјкұ°лЎң лҸҢм•„к°ҖмһҗлҠ” кІғмқҙ м•„лӢҲлӢӨ. мҡ°лҰ¬м—җкІҢ н•„мҡ”н•ң кІғмқҖ AIк°Җ лҢҖмІҙн• мҲҳ м—ҶлҠ” мқёк°„м„ұмқҳ мҳҒм—ӯмқ„ мӮ¬мҲҳн•ҳкі , кё°мҲ мқ„ к·ё лҸ„кө¬лЎң мһ¬м •мқҳн•ҳлҠ” кІғмқҙлӢӨ. мҡ°лҰ¬ мӢ л¬ёмӮ¬к°Җ м§Җн–Ҙн•ҳлҠ” вҖҳмқёк°„ мӨ‘мӢ¬мқҳ мғҒмғҒ м Җл„җлҰ¬мҰҳвҖҷмқҳ кҙҖм җм—җм„ң м„ё к°Җм§Җ лҢҖм•Ҳмқ„ м ңм•Ҳн•ңлӢӨ.
мІ«м§ё, вҖҳкІҪмқҙмқҳ көҗмңЎн•ҷ(Pedagogy of Wonder)вҖҷмқ„ лҸ„мһ…н•ҙм•ј н•ңлӢӨ. көӯм ңкІҪмҳҒлҢҖн•ҷл°ңм „нҳ‘мқҳнҡҢ(AACSB)к°Җ м ңм•Ҳн–Ҳл“Ҝ, AIк°Җ лӢөмқ„ мЈјлҠ” кё°кі„лқјл©ҙ мқёк°„мқҖ м§Ҳл¬ёмқ„ лҚҳм§ҖлҠ” мЎҙмһ¬м—¬м•ј н•ңлӢӨ. көҗмңЎмқҳ лӘ©н‘ңлҠ” нҡЁмңЁм Ғмқё лӢөліҖмқ„ м–»м–ҙлӮҙлҠ” кІғмқҙ м•„лӢҲлқј, AIк°Җ лӮҙлҶ“мқҖ лӢөм—җ вҖңмҷң?вҖқлқјкі л°ҳл¬ён•ҳкі к·ё мқҙл©ҙмқҳ мңӨлҰ¬м Ғ л§ҘлқҪмқ„ нҢҢкі л“ңлҠ” 비нҢҗм Ғ мӮ¬кі лҘј кё°лҘҙлҠ” кІғмқҙлӢӨ. нҳёкё°мӢ¬мқҖ кё°кі„к°Җ к°Җм§Ҳ мҲҳ м—ҶлҠ” мқёк°„л§Ңмқҳ нҠ№к¶ҢмқҙлӢӨ.
л‘ҳм§ё, AIлҘј вҖҳм •лӢө мһҗнҢҗкё°вҖҷк°Җ м•„лӢҢ вҖҳнҶ лЎ нҢҢнҠёл„ҲвҖҷлЎң нҷңмҡ©н•ҙм•ј н•ңлӢӨ. мҪ”л„ӨнӢ°м»·лҢҖн•ҷкіј лҜёмӢңмӢңн”јлҢҖн•ҷ м—°кө¬м§„мқҙ м ңм•Ҳн•ң кІғмІҳлҹј, AIм—җкІҢ л°ҳлЎ мқ„ м ңкё°н•ҳкІҢ н•ҳкі к·ё л…јлҰ¬лҘј к№ЁлңЁлҰ¬лҠ” кіјм •м—җм„ң м•„мқҙл“ӨмқҖ 비нҢҗм Ғ мӮ¬кі л Ҙмқ„ нӮӨмҡё мҲҳ мһҲлӢӨ. AIк°Җ мғқм„ұн•ң н…ҚмҠӨнҠёлҘј 진лҰ¬(Truth)к°Җ м•„лӢҢ кІҖмҰқ лҢҖмғҒ(Target)мңјлЎң л°”лқјліҙкІҢ к°ҖлҘҙміҗм•ј н•ңлӢӨ.
м…Ӣм§ё, нҸүк°Җмқҳ нҢЁлҹ¬лӢӨмһ„мқ„ вҖҳкІ°кіјвҖҷм—җм„ң вҖҳкіјм •вҖҷмңјлЎң м „нҷҳн•ҙм•ј н•ңлӢӨ. л§ӨлҒ„лҹ¬мҡҙ мөңмў… м—җм„ёмқҙліҙлӢӨлҠ” нҲ¬л°•н•ң мҙҲм•Ҳ, мҲҳм •мқҳ нқ”м Ғмқҙ лӢҙкёҙ л…ёнҠё, AIмҷҖмқҳ м№ҳм—ҙн•ң лҢҖнҷ” лЎңк·ёлҘј нҸүк°Җн•ҙм•ј н•ңлӢӨ. к·ёкІғмқҙ вҖҳмқём§Җм Ғ мҷёмЈјнҷ”вҖҷлҘј л§үкі , м•„мқҙл“Өмқҳ кі мң н•ң мӮ¬кі кіјм •мқ„ м§ҖнӮӨлҠ” мң мқјн•ң кёёмқҙлӢӨ.
2026л…„ 2мӣ”, AIлҠ” лҚ” мқҙмғҒ мӢ кё°н•ң мһҘлӮңк°җмқҙ м•„лӢҲлӢӨ. к·ёкІғмқҖ мқҙлҜё кіөкё°мІҳлҹј көҗмӢӨмқ„ мұ„мҡ°кі мһҲлӢӨ. көҗмӮ¬л“Өмқҳ м—…л¬ҙк°Җ мӨ„м–ҙл“Өкі , м•„мқҙл“Өмқҙ лҚ” мүҪкІҢ м§ҖмӢқм—җ м ‘к·јн•ҳкІҢ лҗң кІғмқҖ 분лӘ… нҷҳмҳҒн• мқјмқҙлӢӨ.
н•ҳм§Җл§Ң к·ё лӮЁлҠ” мӢңк°„м—җ мҡ°лҰ¬лҠ” л¬ҙм—Үмқ„ н•ҳкі мһҲлҠ”к°Җ. лӢЁмҲңнһҲ лҚ” л§ҺмқҖ м§ҖмӢқмқ„ мЈјмһ…н•ҳкі мһҲлҠ”к°Җ, м•„лӢҲл©ҙ м•„мқҙл“Өмқҙ л°Өн•ҳлҠҳмқ„ ліҙл©° м—үлҡұн•ң мғҒмғҒмқ„ н• мӢңк°„мқ„ мЈјкі мһҲлҠ”к°Җ.
нҡЁмңЁм„ұмқҖ кё°кі„мқҳ лҜёлҚ•мқҙм§Җ мқёк°„мқҳ лҜёлҚ•мқҙ м•„лӢҲлӢӨ. мҡ°лҰ¬к°Җ кёёлҹ¬лӮҙм•ј н• м•„мқҙл“ӨмқҖ мөңм Ғнҷ”лҗң м•Ңкі лҰ¬мҰҳмқ„ л”°лҘҙлҠ” кё°мҲ мһҗк°Җ м•„лӢҲлқј, к·ё м•Ңкі лҰ¬мҰҳмқҙ лӢҝм§Җ лӘ»н•ҳлҠ” лӮҜм„ кёёмқ„ мғҒмғҒн•ҳкі , кё°кәјмқҙ н—Ө맬 мӨ„ м•„лҠ” мқёк°„мқҙлӢӨ. 2027л…„ м°Ҫмқҳм„ұмқҳ мў…л§җмқ„ л§үмқ„ мң мқјн•ң л°©лІ•мқҖ, м •лӢөмқ„ л№ЁлҰ¬ м°ҫлҠ” лІ•мқҙ м•„лӢҲлқј м •лӢөмқҙ м—ҶлҠ” м„ёкі„м—җм„ңлҸ„ кёёмқ„ мһғм§Җ м•ҠлҠ” лІ•мқ„ к°ҖлҘҙм№ҳлҠ” кІғмқҙлӢӨ. м•„мқҙл“Өмқҳ мұ…мғҒ мң„м—җ лҶ“мқё нғңлё”лҰҝ PC нҷ”л©ҙ л„ҲлЁё, к·ёл“Өмқҳ лҲҲлҸҷмһҗк°Җ м—¬м „нһҲ нҳёкё°мӢ¬мңјлЎң л№ӣлӮҳкі мһҲлҠ”м§Җ л“Өм—¬лӢӨлҙҗм•ј н• л•Ң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