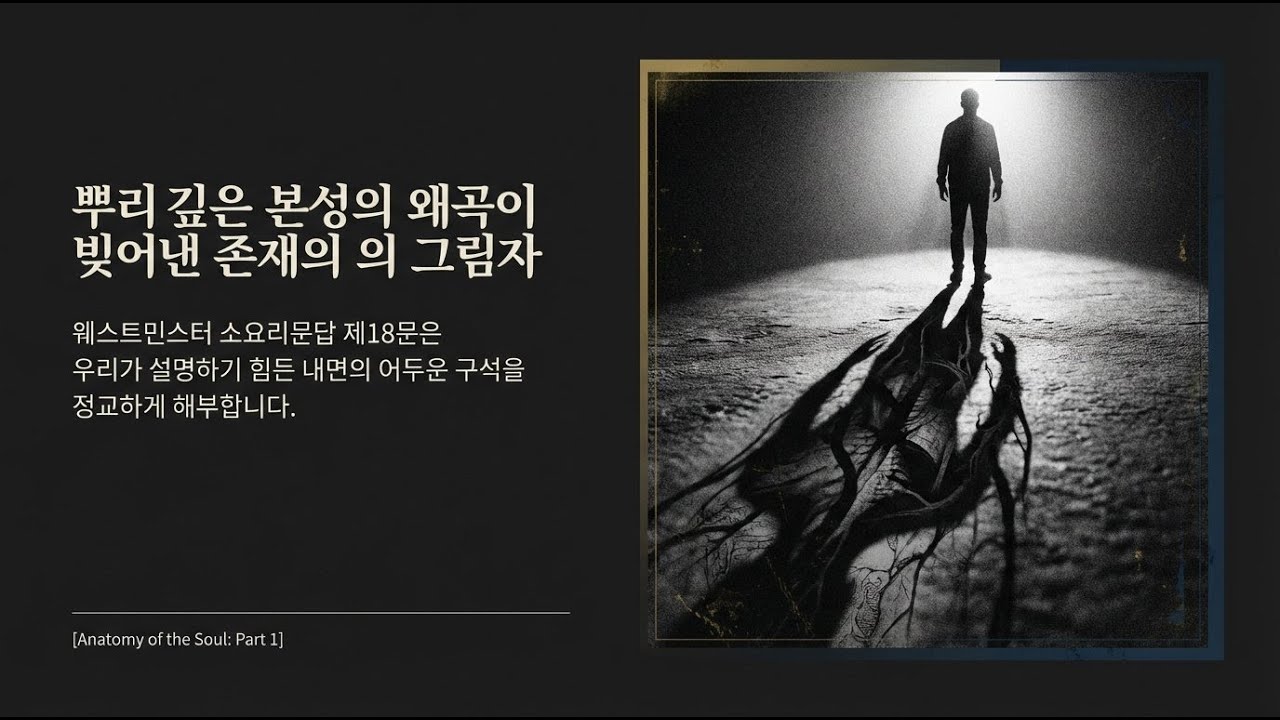어른이 잃어버린 놀이의 시간, 『넉 점 반』이 건네는 따뜻한 회상
『넉 점 반』은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아이의 심부름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몇 장을 넘기다 보면, 그 안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던 시절의 인간적 온도”가 살아 숨 쉰다.
집집마다 시계가 없던 시절, 한 아이가 엄마 심부름으로 “시간을 물으러” 가게 된다. 하지만 길 위에서 닭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다가, 접시꽃 아래서 개미 떼를 구경하다가, 고추잠자리를 따라가다 심부름을 까맣게 잊는다. 결국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돌아와 “시방 넉 점 반이래.”라고 능청스럽게 말하는 아이.
이 짧은 여정 속에는 ‘시간의 본질을 모르는 존재만이 순수할 수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가 숨어 있다.
어린이는 시간을 잊고 살아간다. 반면 어른은 시간을 쫓기며 산다. 『넉 점 반』은 그 대조를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그려낸다.
이영경의 그림은 그런 시간의 결을 시각적으로 번역해낸다. 바랜 한지 배경 위에 다홍빛 치마가 선명하게 자리한다. 그것은 단순한 색채의 대비가 아니라, 잊힌 시절의 기억을 불러내는 ‘감각의 문’이다.
그림 속 아이의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독자 역시 멈춰 서서 함께 바라보게 된다.
『넉 점 반』을 읽는다는 것은, ‘바쁘게 살아온 나 자신을 잠시 멈춰 세우는 일’이다.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다. 한국 동요문학의 거장 윤석중의 동시와, 한국적 그림책 미학의 선구자 이영경의 손끝이 만난 결정체이다.
1940년에 발표된 윤석중의 시 「넉 점 반」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깃든 시적 감수성’을 담은 명작이다.
그 시절에는 ‘시간을 재는 도구’보다 ‘살아가는 리듬’이 우선이었다. 해의 위치, 닭의 울음, 그림자의 길이가 곧 시계였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연’과 이어져 있다.
이영경은 이 시의 세계를 1960년대 충남 농촌의 배경으로 재해석했다.
그녀는 실제로 서산의 운산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노인들의 기억 속 풍경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래서 책 속 장면 하나하나는 단순한 삽화가 아니라, 기억의 복원이다.
그림책의 판형이 커지고 색감이 밝아진 이번 20주년 개정판은,
단순히 복원된 과거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시각 언어”로 새롭게 완성되었다.
윤석중의 언어가 리듬이라면, 이영경의 그림은 그 리듬이 만들어내는 파동이다.
두 예술가의 만남이 빚어낸 이 조화는, 한국 그림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시간을 잊었던 순간’은 언제나 행복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진흙을 만지거나, 강가를 따라 걷던 시간.
『넉 점 반』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몰입은 단지 유년의 장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 자유에 대한 은유이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개념, ‘몰입(flow)’은 이 작품을 해석하는 또 다른 열쇠가 된다.
아이는 목적 없이 세상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존재의 리듬을 느낀다.
그는 닭, 개미, 잠자리 등 생명체를 보며 “노는 것의 본질”을 배운다.
놀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우리는 늘 스마트폰과 시계에 묶여 살아간다.
시간을 통제하고, 효율을 계산하며, ‘놀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간다.
『넉 점 반』은 바로 그런 어른들에게 조용히 말한다.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놀다 보면, 삶이 보이니까요.”
이 작품의 진정한 미학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대신, 그 잃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윤석중이 아이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다.
『넉 점 반』은 20년 전 처음 출간되었을 때도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이 책을 더 절실하게 읽는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기보다 화면 속 세계에 갇힌 시대,
어른이 ‘놀 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지금,
이 책은 단지 “동심의 복원”을 넘어 “인간다움의 복원”을 요청한다.
본문의 서체는 『오륜행실도』의 글자를 집자하여 구성되었고, 한지 느낌의 배경은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오래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각적 장치 덕분에 『넉 점 반』은 단순한 아동용 그림책을 넘어
‘시간과 기억에 대한 예술서’로 읽힌다.
20주년 개정판은 새로운 독자층, 즉 ‘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주는 어른 세대’에게
더 큰 울림을 전한다.
그림 속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 된다.
『넉 점 반』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안에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
즉 “놀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보다, 바로 그 마음이다.
『넉 점 반』은 단순히 과거의 시골을 그린 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아이의 시간”을 불러낸다.
책을 덮는 순간, 독자는 어느새 그 아이와 함께 접시꽃 아래에 쪼그려 앉아
개미 한 마리를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넉 점 반』이 여전히 독자의 곁에 머무는 이유는
그 안에 “어른이 된 우리를 위한 동화”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중의 언어는 시대를 초월하고, 이영경의 그림은 기억을 시각화한다.
그리고 이 두 세계의 만남은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된다.
“인생의 진짜 시계는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간다.”
『넉 점 반』은 시간을 잃은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해,
결국 시간을 되찾는 어른의 이야기로 끝난다.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20년을 건너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