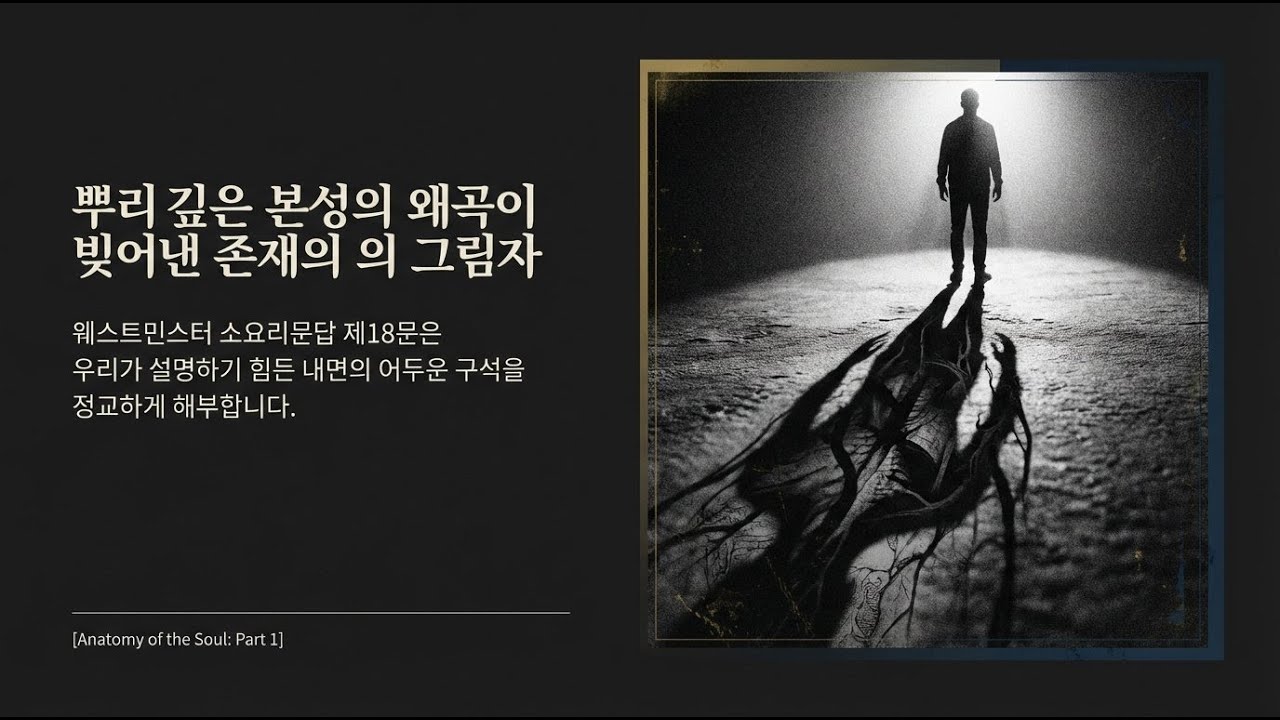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л¶ҖлҸҷмӮ°м •ліҙмӢ л¬ё] мқҙлҜёмҳҒ кё°мһҗ = л¶ҖлҸҷмӮ° мқјмқҖ нқ”нһҲ л§ӨмҲҳмһҗмҷҖ л§ӨлҸ„мһҗлҘј м—°кІ°н•ҙ мЈјлҠ” мқјлЎңл§Ң мғқк°ҒлҗңлӢӨ. н•ҳм§Җл§Ң мӢӨм ң нҳ„мһҘм—җм„ң кіөмқёмӨ‘к°ңмӮ¬к°Җ н•ҳлҠ” мқјмқҖ к·ёліҙлӢӨ нӣЁм”¬ л„“лӢӨ. к°ҖкІ©мқ„ л§һ추лҠ” мӮ¬лһҢмқҙ м•„лӢҲлқј, кұ°лһҳ кө¬мЎ° м „мІҙлҘј мқҪкі нҢҗлӢЁн•ҳлҠ” м—ӯн• м—җ к°Җк№қлӢӨ.
вҖӢ
мөңк·ј н•ң кұ°лһҳк°Җ к·ёлһ¬лӢӨ. 비мҠ·н•ң мЎ°кұҙмқҳ л§Өл¬ј к°ҖмҡҙлҚ° н•ң кіімқҙ л§ҲмқҢм—җ л“Өм–ҙ кі„м•Ҫмқ„ 진н–үн•ҳл Ө н•ҳмһҗ, л§ӨмҲҳмһҗлҠ” к°ҖкІ©мқ„ мЎ°кёҲ лҚ” мҳ¬л ӨлӢ¬лқјкі н–ҲлӢӨ. мһ…м§ҖлҸ„ мўӢкі мһҗлҰ¬лҸ„ мўӢм•„ мӣ¬л§Ңн•ҳл©ҙ к·ёлғҘ 진н–үн•ҙлҸ„ лҗ мғҒнҷ©мқҙм—ҲлӢӨ. н•ҳм§Җл§Ң кіөмқёмӨ‘к°ңмӮ¬лҠ” кі„м•Ҫмқ„ л§җл ёлӢӨ. вҖңмқҙ л§Өл¬јмқҖ м§ҖкёҲ к°ҖкІ©мңјлЎңлҠ” мҶҗлӢҳк»ҳ к¶Ңн•ҳкё° м–ҙл өмҠөлӢҲлӢӨ.вҖқ мӨ‘к°ңмӮ¬лҠ” н•ҙлӢ№ л§Өл¬јмқҙ мӢңм„ё лҢҖ비 비мӢёлӢӨкі нҢҗлӢЁн–Ҳкі , лҚ” лӮҳмқҖ м„ нғқм§Җк°Җ лӮҳмҳ¬ мҲҳ мһҲлӢӨкі лҙӨлӢӨ. л©°м№ л’Ө, к°ҷмқҖ мЎ°кұҙмқҙл©ҙм„ңлҸ„ лҚ” н•©лҰ¬м Ғмқё к°ҖкІ©мқҳ л§Өл¬јмқҙ м ңмӢңлҗҗкі кі„м•ҪмқҖ мІҳмқҢліҙлӢӨ нӣЁм”¬ мң лҰ¬н•ң мЎ°кұҙм—җм„ң мқҙлӨ„мЎҢлӢӨ.
вҖӢ
мқҙ кұ°лһҳк°Җ к°ҖлҠҘн–ҲлҚҳ мқҙмң лҠ” лӢЁмҲңн•ң мҡҙмқҙ м•„лӢҲм—ҲлӢӨ. мӨ‘к°ңмӮ¬лҠ” кіјкұ°м—җлҸ„ н•ҙлӢ№ мһҗмӮ°мқҳ мҶҢмң мЈјмҷҖ кұ°лһҳн•ң кІҪн—ҳмқҙ мһҲм–ҙ л§Өк°Ғ л°°кІҪкіј мһҗкёҲ мғҒнҷ©мқ„ мқҙлҜё нҢҢм•…н•ҳкі мһҲм—ҲлӢӨ. м—¬кё°м—җ м–‘лҸ„мҶҢл“қм„ё кө¬мЎ°лҘј н•Ёк»ҳ м„ӨлӘ…н–ҲлӢӨ. мқјм • кёҲм•Ў мқҙмғҒмқ„ лҚ” л°ӣм•„лҸ„ м„ёмңЁмқҙ мҳ¬лқј кІ°көӯ м„ёкёҲмңјлЎң л№ м ёлӮҳк°Ҳ к°ҖлҠҘм„ұмқҙ нҒ¬лӢӨл©ҙ, к°ҖкІ©мқ„ мЎ°м •н•ҙ л№ лҘҙкІҢ кұ°лһҳн•ҳлҠ” нҺёмқҙ н•©лҰ¬м ҒмқҙлқјлҠ” нҢҗлӢЁмқҙм—ҲлӢӨ. л§ӨлҸ„мһҗлҠ” мқҙлҘј л°ӣм•„л“ӨмҳҖкі кұ°лһҳлҠ” мӣҗл§Ңн•ҳкІҢ л§Ҳл¬ҙлҰ¬лҗҗлӢӨ.
вҖӢ
мқҙмҷҖ 비мҠ·н•ң мӮ¬лЎҖлҠ” лҳҗ мһҲлӢӨ. кіөмӢӨмқҙ кёём–ҙм§ҖлҚҳ кұҙл¬јм—җ лҢҖн•ҙ л¬ҙмһ‘м • мһ„м°Ёмқёмқ„ м°ҫкё°ліҙлӢӨ, кіөк°„ к·ңлӘЁлҘј м°ҫлҚҳ н”„лһңм°ЁмқҙмҰҲ ліёмӮ¬лҘј м—°кІ°н•ҙ мһҘкё° кі„м•Ҫмқ„ м„ұмӮ¬мӢңнӮЁ кІҪмҡ°лҸ„ мһҲм—ҲлӢӨ. мһ„лҢҖлЈҢлҘј мқјл¶Җ мЎ°м •н•ҳлҠ” лҢҖмӢ кіөмӢӨ лҰ¬мҠӨнҒ¬лҘј мӨ„мқҙкі мһҗмӮ°мқҳ м•Ҳм •м„ұмқ„ лҶ’мқё м„ нғқмқҙм—ҲлӢӨ.
вҖӢ
лҳҗ лӢӨлҘё кІҪмҡ°м—җлҠ” к°ңл°ң к°ҖлҠҘм„ұмқҙ мһҲлҠ” нҶ м§ҖлҘј кёүнһҲ л§Өк°Ғн•ҳл ӨлҚҳ мҶҢмң мЈјм—җкІҢ мӨ‘к°ңмӮ¬к°Җ вҖңм§ҖкёҲмқҖ нҢҢлҠ” мӢңм җмқҙ м•„лӢҲлӢӨвҖқлқјкі мЎ°м–ён–ҲлӢӨ. мЈјліҖ к°ңл°ң кі„нҡҚмқҙ к°ҖмӢңнҷ”лҗ л•Ңк№Ңм§Җ нҷңмҡ© л°©м•Ҳмқ„ м •лҰ¬н•ң л’Ө л§Өк°Ғ мӢңм җмқ„ мЎ°м •н–Ҳкі , 1л…„ л’Ө мһҗмӮ° к°Җм№ҳлҠ” нҒ¬кІҢ лӢ¬лқјмЎҢлӢӨ.
вҖӢ
мқҙ мӮ¬лЎҖл“Өмқҳ кіөнҶөм җмқҖ 분лӘ…н•ҳлӢӨ. мң лҠҘн•ң кіөмқёмӨ‘к°ңмӮ¬лҠ” кұ°лһҳлҘј м„ңл‘җлҘҙм§Җ м•ҠлҠ”лӢӨ. к°ҖкІ©л§Ң ліҙм§Җ м•Ҡкі м„ёкёҲ, кіөмӢӨ, нҷңмҡ© к°ҖлҠҘм„ұ, к·ёлҰ¬кі мӢңк°„мқ„ н•Ёк»ҳ кі„мӮ°н•ңлӢӨ. кі„м•Ҫмқ„ м„ұмӮ¬мӢңнӮӨлҠ” мӮ¬лһҢмқҙ м•„лӢҲлқј, кұ°лһҳмқҳ кІ°кіјк№Ңм§Җ мұ…мһ„м§ҖлҠ” мӮ¬лһҢмқҙлӢӨ.
вҖӢ
л¶ҖлҸҷмӮ°мқҖ лӢЁмҲңн•ң мһҗмӮ°мқҙ м•„лӢҲлқј м„ нғқмқҳ кІ°кіјк°Җ мҢ“мқҙлҠ” мҳҒм—ӯмқҙлӢӨ. к·ё м„ нғқмқҳ мҲңк°„л§ҲлӢӨ м–ҙл–Ө кіөмқёмӨ‘к°ңмӮ¬лҘј л§ҢлӮҳлҠҗлғҗм—җ л”°лқј кІ°кіјлҠ” нҒ¬кІҢ лӢ¬лқјм§„лӢӨ. к·ёлһҳм„ң мқҙ л§җмқҙ м—¬м „нһҲ нҶөн•ңлӢӨ. кіөмқёмӨ‘к°ңмӮ¬ мһҳ л§ҢлӮҳл©ҙ, мһҗлӢӨк°ҖлҸ„ л–Ўмқҙ мғқкёҙ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