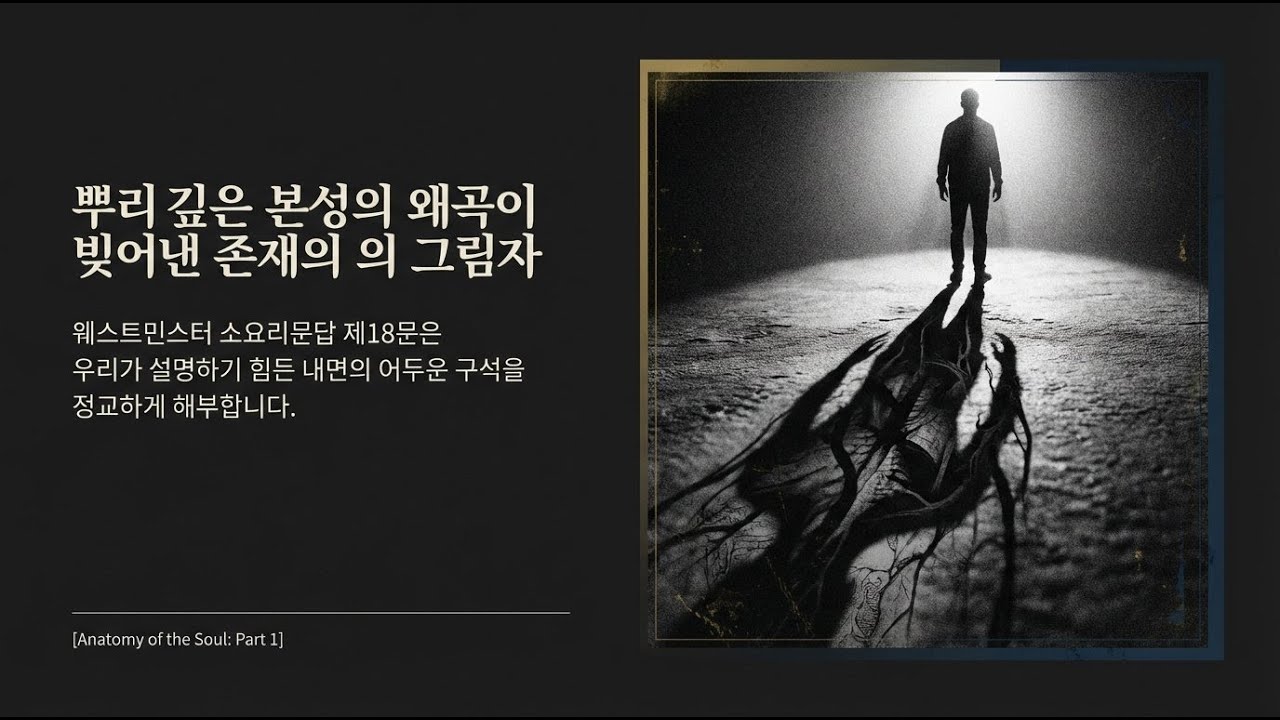л¶ҖлҸҷмӮ° мӢңмһҘм—җм„ң нҶ м§ҖлҠ” лҠҳ к°ҖмһҘ м–ҙл Өмҡҙ мҳҒм—ӯмңјлЎң лӮЁм•„ мһҲлӢӨ. м•„нҢҢнҠёмІҳлҹј мӢңм„ёк°Җ лӘ…нҷ•н•ҳкІҢ л“ңлҹ¬лӮҳм§Җ м•Ҡкі , мһ…м§ҖмҷҖ к°ңл°ң кі„нҡҚ, к·ңм ңмҷҖ н–үм • н•ҙм„қм—җ л”°лқј к°Җм№ҳк°Җ к·№лӢЁм ҒмңјлЎң лӢ¬лқјм§Җкё° л•Ңл¬ёмқҙлӢӨ. к·ёлҹјм—җлҸ„ л¶Ҳкө¬н•ҳкі нҶ м§Җ кі„м•ҪмқҖ мў…мў… вҖңкҙңм°®лӢӨлҚ”лқјвҖқ, вҖңкі§ к°ңл°ңлҗңлӢӨлҚ”лқјвҖқлҠ” л§җ н•ңл§Ҳл””м—җ мқҳн•ҙ кІ°м •лҗңлӢӨ. л¬ём ңлҠ” к·ё нҢҗлӢЁмқҳ кІ°кіјк°Җ лӘҮ л…„, нҳ№мқҖ лӘҮмӢӯ л…„ лҸҷм•Ҳ лҗҳлҸҢлҰҙ мҲҳ м—ҶлҠ” м„ нғқмңјлЎң лӮЁлҠ”лӢӨлҠ” м җмқҙлӢӨ.
нҷ©кёҲ집땅(мҳӨлҜјмҳҒ лҢҖн‘ң)мқҳ мұ… гҖҺк·ё нҶ м§Җ кі„м•Ҫн•ҙлҸ„ лҗҳлӮҳмҡ”?гҖҸлҠ” л°”лЎң мқҙ м§Җм җм—җм„ң м¶ңл°ңн•ңлӢӨ. мқҙ мұ…мқҖ нҶ м§Җ нҲ¬мһҗлЎң нҒ° мҲҳмқөмқ„ м–»лҠ” л°©лІ•мқ„ м•һм„ёмҡ°м§Җ м•ҠлҠ”лӢӨ. лҢҖмӢ кі„м•Ҫм„ңм—җ лҸ„мһҘмқ„ м°Қкё° м „, л°ҳл“ңмӢң мҠӨмҠӨлЎңм—җкІҢ лҚҳм ём•ј н• м§Ҳл¬ёмқҙ л¬ҙм—Үмқём§ҖлҘј 차분н•ҳкІҢ м§ҡлҠ”лӢӨ. вҖңмқҙ нҶ м§ҖлҠ” мҷң мқҙ к°ҖкІ©мқёк°ҖвҖқ, вҖңмқҙ л•…мқҳ мҡ©лҸ„лҠ” м§ҖкёҲкіј м•һмңјлЎң м–ҙл–»кІҢ лӢ¬лқјм§Ҳ мҲҳ мһҲлҠ”к°ҖвҖқ, вҖңлӮҙк°Җ к°җлӢ№н•ҙм•ј н• лҰ¬мҠӨнҒ¬лҠ” л¬ҙм—Үмқёк°ҖвҖқ к°ҷмқҖ м§Ҳл¬ёл“ӨмқҙлӢӨ.
мұ… м „л°ҳм—җ нқҗлҘҙлҠ” м Җмһҗмқҳ мӢңм„ мқҖ мқјкҙҖлҗҳлӢӨ. нҶ м§Җ кі„м•ҪмқҖ мҡҙм—җ л§Ўкёё мқјмқҙ м•„лӢҲлқј, 충분нһҲ м җкІҖн•ҳкі мӨҖл№„н• мҲҳ мһҲлҠ” кіјм •мқҙлқјлҠ” кІғмқҙлӢӨ. мӢӨм ңлЎң л§ҺмқҖ нҶ м§Җ кҙҖл Ё 분мҹҒкіј мҶҗмӢӨмқҖ м •ліҙлҘј лӘ°лқјм„ңлқјкё°ліҙлӢӨ, м •ліҙлҘј м ңлҢҖлЎң н•ҙм„қн•ҳм§Җ лӘ»н•ң лҚ°м„ң л°ңмғқн•ңлӢӨ. нҶ м§Җмқҙмҡ©кі„нҡҚнҷ•мқём„ң, м§ҖлӘ©кіј мҡ©лҸ„м§Җм—ӯ, к°ңл°ң м ңн•ңкіј н–үмң„ м ңн•ң к°ҷмқҖ кё°ліё м •ліҙл“ӨмқҖ кіөк°ңлҸј мһҲм§Җл§Ң, мқҙлҘј м–ҙл–»кІҢ мқҪм–ҙм•ј н•ҳлҠ”м§Җм—җ лҢҖн•ң м•ҲлӮҙлҠ” лҠҳ л¶ҖмЎұн–ҲлӢӨ.
нҷ©кёҲ집땅(мҳӨлҜјмҳҒ лҢҖн‘ң)мқҖ мқҙ кіөл°ұмқ„ л©”мҡҙлӢӨ. к·ёлҠ” нҶ м§Җ м •ліҙлҘј вҖҳм•„лҠ” кІғвҖҷкіј вҖҳнҢҗлӢЁн•ҳлҠ” кІғвҖҷ мӮ¬мқҙмқҳ к°„к·№мқ„ м„ӨлӘ…н•ҳлҠ” лҚ° 집мӨ‘н•ңлӢӨ. мҳҲм»ЁлҢҖ к°ңл°ң кі„нҡҚмқҙ мһҲлӢӨлҠ” л§җмқҙ мӢӨм ң мӮ¬м—…мңјлЎң мқҙм–ҙм§Җкё°к№Ңм§Җ м–ҙл–Ө м Ҳм°ЁлҘј кұ°міҗм•ј н•ҳлҠ”м§Җ, н–үм • л¬ём„ңм—җ м ҒнһҢ л¬ёкө¬ н•ҳлӮҳк°Җ кі„м•Ҫ мқҙнӣ„ м–ҙл–Ө м ңм•ҪмңјлЎң лҸҢм•„мҳ¬ мҲҳ мһҲлҠ”м§ҖлҘј нҳ„мӢӨм Ғмқё м–ём–ҙлЎң н’Җм–ҙлӮёлӢӨ. мқҙ кіјм •м—җм„ң лҸ…мһҗлҠ” мһҗм—°мҠӨлҹҪкІҢ к№ЁлӢ«кІҢ лҗңлӢӨ. нҶ м§Җ кі„м•Ҫм—җм„ң к°ҖмһҘ мң„н—ҳн•ң мҲңк°„мқҖ м •ліҙлҘј лӘЁлҘј л•Ңк°Җ м•„лӢҲлқј, м•Ңм•ҳлӢӨкі м°©к°Ғн• л•ҢлқјлҠ” мӮ¬мӢӨмқ„.
мқҙ мұ…мқҙ мқҳлҜё мһҲлҠ” мқҙмң лҠ” нҶ м§ҖлҘј нҲ¬мһҗ мғҒн’Ҳ мқҙм „м—җ вҖҳкі„м•ҪвҖҷмқҳ кҙҖм җм—җм„ң л°”лқјліҙкё° л•Ңл¬ёмқҙлӢӨ. нҶ м§Җ кұ°лһҳлҠ” лӢЁмҲңн•ң л§ӨмҲҳВ·л§ӨлҸ„мқҳ л¬ём ңк°Җ м•„лӢҲлқј, лІ•кіј н–үм •, мӢңк°„кіј 비мҡ©мқ„ н•Ёк»ҳ л– м•ҲлҠ” м„ нғқмқҙлӢӨ. м ҖмһҗлҠ” мқҙ ліөн•©м Ғмқё кө¬мЎ°лҘј кіјмһҘ м—Ҷмқҙ м„ӨлӘ…н•ҳл©°, мөңмҶҢн•ңмқҳ м җкІҖл§ҢмңјлЎңлҸ„ н”јн• мҲҳ мһҲлҠ” мң„н—ҳл“Өмқҙ м–јл§ҲлӮҳ л§ҺмқҖм§ҖлҘј ліҙм—¬мӨҖлӢӨ. к·ё м„ӨлӘ…мқҖ лҸ…мһҗлҘј кІҒмЈјкё° мң„н•ң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нҢҗлӢЁмқҳ кё°мӨҖмқ„ м„ёмҡ°кё° мң„н•ң кІғмқҙлӢӨ.
мөңк·ј л¶ҖлҸҷмӮ° мӢңмһҘмқҙ л¶Ҳнҷ•мӢӨм„ұмқ„ нӮӨмӣҢк°Җл©ҙм„ң нҶ м§Җм—җ лҢҖн•ң кҙҖмӢ¬мқҖ лӢӨмӢң лҶ’м•„м§Җкі мһҲлӢӨ. к°ңл°ң кё°лҢҖк°Җ мһҲлҠ” м§Җм—ӯ, мғҒлҢҖм ҒмңјлЎң м Җл ҙн•ҙ ліҙмқҙлҠ” к°ҖкІ©мқҖ лҠҳ л§Өл Ҙм 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 к·ёлҹ¬лӮҳ мқҙлҹ° мӢңкё°мқјмҲҳлЎқ н•„мҡ”н•ң кІғмқҖ мҶҚлҸ„к°Җ м•„лӢҲлқј кё°мӨҖмқҙлӢӨ. гҖҺк·ё нҶ м§Җ кі„м•Ҫн•ҙлҸ„ лҗҳлӮҳмҡ”?гҖҸлҠ” вҖңмӮ¬лҸ„ лҗҳлҠ”к°Җ, л§җм•„м•ј н•ҳлҠ”к°ҖвҖқлҘј лҢҖмӢ кІ°м •н•ҙмЈјм§Җ м•ҠлҠ”лӢӨ. лҢҖмӢ кі„м•Ҫмқ„ кІ°м •н•ҳкё° м „м—җ л°ҳл“ңмӢң нҷ•мқён•ҙм•ј н• м§Ҳл¬ёл“Өмқ„ лҸ…мһҗ мҶҗм—җ мҘҗм—¬мӨҖлӢӨ.
нҶ м§Җ нҲ¬мһҗлҘј кі лҜјн•ҳлҠ” мӮ¬лһҢлҝҗ м•„лӢҲлқј, м–ём к°Җ нҶ м§ҖлҘј кі„м•Ҫн•ҙм•ј н• к°ҖлҠҘм„ұмқҙ мһҲлҠ” лӘЁл“ мқҙм—җкІҢ мқҙ мұ…мқҖ н•ҳлӮҳмқҳ мІҙнҒ¬лҰ¬мҠӨнҠёмІҳлҹј мқҪнһҢлӢӨ. нҷ”л Өн•ң м„ұкіөлӢҙ лҢҖмӢ , кі„м•Ҫмқҳ м¶ңл°ңм„ м—җм„ң мҠӨмҠӨлЎңлҘј м§ҖнӮ¬ мҲҳ мһҲлҠ” кё°мӨҖмқ„ м„ёмӣҢмЈјлҠ” мұ…. к·ёкІғмқҙ гҖҺк·ё нҶ м§Җ кі„м•Ҫн•ҙлҸ„ лҗҳлӮҳмҡ”?гҖҸк°Җ к°–лҠ” к°ҖмһҘ нҒ° к°Җм№ҳ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