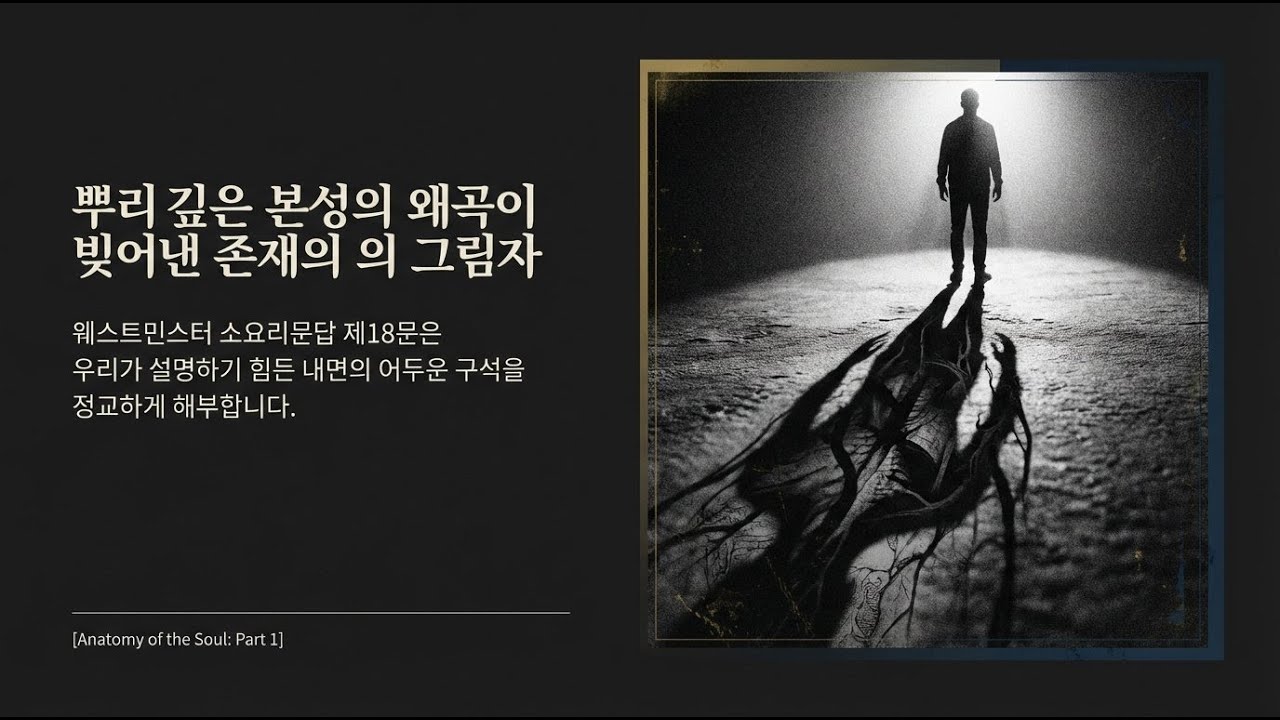ìÜ░ÙмÙèö ìä©Û│äÙÑ╝ ìØ┤ÿò┤ÿò£ÙïñÛ│á Ù»┐ìğÇÙğî, ìïñìá£Ùí£Ùèö ìä©Û│äÙÑ╝ ìí░Û░üÙé┤ìû┤ ìØ┤ÿò┤ÿò£Ùïñ. ÿòÖÙ¼©ìØÇ ÙÂäÛ│╝Ùí£ ÙéİÙëİÛ│á, ìğÇìïØìØÇ ìáäÙ¼©ÿÖöÙÉİÙ®░, ìØ©Û░äìØÇ ìŞÉìù░Û│╝ ìŞÉìïáìØä ÛÁ¼ÙÂäÿò£Ùïñ. Ù¬¿Ùôá Û▓âìØÇ ÿòİÙéİÙïñÙèö ìØ┤Ùş¼ÿò£ ÙÂäÙмìØİ ìèÁÛ┤ÇìùÉ ìğêÙ¼©ìØä ÙıİìğÇÙèö ì▒àìØ┤Ùïñ. ìáÇìŞÉ ÿòİìØ©ÙмÿŞê ÿÄİìèñÙèö ÙÅàìØ╝ìØİ ìØ┤ÙíáÙ¼╝ÙмÿòÖìŞÉÙí£, ìûæìŞÉìŞÑÙíáÛ│╝ ìŞàìŞÉÙ¼╝ÙмÿòÖìØä ìù░ÛÁ¼ÿò┤ ìİ¿ ÿòÖìŞÉÙïñ. ÛÀ©Ùèö Û│╝ÿòÖìŞÉìØİ ìû©ìû┤Ùí£ ÙğÉÿòİìğÇÙğî, ÛÀ© Ù¼©ìá£ìØİìïØìØÇ ì▓áÿòÖìáüìØ┤Ùïñ. ìä©Û│äÙèö Û│╝ìù░ ÙÂäÙмÙÉİìû┤ ìí┤ìŞ¼ÿòİÙèöÛ░Ç, ìòäÙïêÙ®┤ Ù│©ìğêìáüì£╝Ùí£ ÿòİÙéİìØ©Û░Ç.
ìØ┤ ì▒àìØİ ÿòÁìï¼ìØÇ ÿİäÙîÇ Ù¼╝ÙмÿòÖ, ÿè╣ÿŞê ìûæìŞÉìù¡ÿòÖìØ┤ ìá£ìï£ÿòİÙèö ÿåÁì░░ìØä ÿåÁÿò┤ ÔÇİÛ░£Ù│äìáü ìí┤ìŞ¼ÔÇÖÙØ╝Ùèö Û┤ÇÙàÉìØä ìŞ¼Û▓ÇÿåáÿòİÙèö Ùı░ ìŞêÙïñ. Û│áìáäÙ¼╝ÙмÿòÖìØÇ ìä©Û│äÙÑ╝ ÙÅàÙĞ¢ÙÉ£ ìŞàìŞÉÙôñìØİ ìğæÿò®ì£╝Ùí£ ìØ┤ÿò┤ÿûêÙïñ. ÛÀ©Ùş¼Ùéİ ìûæìŞÉìù¡ÿòÖìØÇ ìŞàìŞÉÛ░Ç ÙÅàÙĞ¢ìáü ìïñì▓┤ÙØ╝Û©░Ù│┤Ùïñ ìâüÿİ© ìû¢ÿŞİ ìåıìùÉìä£Ùğî ìØİÙ»©ÙÑ╝ Û░ûÙèö ìí┤ìŞ¼ìŞäìØä Ù│┤ìù¼ìñÇÙïñ. ìû¢ÿŞİ(entanglement)ìØÇ ÙæÉ ìŞàìŞÉÛ░Ç Û│ÁÛ░äìáüì£╝Ùí£ Ù®ÇÙм Ùû¿ìû┤ìá© ìŞêìû┤ÙÅä ÿòİÙéİìØİ ìâüÿâ£Ùí£ ìù░Û▓░ÙÉİìû┤ ìŞêìØîìØä ìØİÙ»©ÿò£Ùïñ. ìØ┤ Ù░£Û▓¼ìØÇ Ùï¿ìğÇ Ù¼╝ÙмÿòÖìØİ Û©░ìêáìáü ìä▒ìÀ¿Û░Ç ìòäÙïêÙØ╝, ìí┤ìŞ¼Ùíáìáü ìğêÙ¼©ìØä ì┤ëÙ░£ÿò£Ùïñ. ìÜ░ÙмÛ░Ç ÔÇİÙéİÔÇÖÙØ╝Û│á ÙÂÇÙÑ┤Ùèö ìØ┤ ìí┤ìŞ¼ ìù¡ìï£, ÙÅàÙĞ¢ÙÉ£ Û░£ì▓┤ÙØ╝Û©░Ù│┤Ùïñ Û▒░ÙîÇÿò£ Û┤ÇÛ│äÙğØìØİ ÿò£ ÿæ£ÿİäìØÇ ìòäÙïÉÛ╣î.
ÿÄİìèñÙèö Û│╝Û░ÉÿòİÛ▓î ÙğÉÿò£Ùïñ. ìÜ░ìú╝Ùèö ÛÀ╝Ù│©ìáüì£╝Ùí£ ÿòİÙéİìØİ ìûæìŞÉìâüÿâ£ìØ┤Ù®░, ìÜ░ÙмÛ░Ç Û▓¢ÿùİÿòİÙèö ÙÂäÙмÙèö Û┤Çì©íÛ│╝ ìØ©ìïØìØİ ìé░Ù¼╝ìØ╝ ìêİ ìŞêÙïñÛ│á. ìØ┤Ùèö Ù▓öìïáÙíáìáü ìğüÛ┤ÇìØ┤Ùéİ ÙÅÖìûæì▓áÿòÖìØİ ÿåÁÿò® ìé¼ì£áìÖÇÙÅä Ùï┐ìòä ìŞêìğÇÙğî, ÛÀ©Ùèö ìïáÙ╣äìú╝ìØİÙí£ Ù»©ÙüäÙş¼ìğÇìğÇ ìòèÙèöÙïñ. ìİñÿŞêÙáñ ìêİÿòÖìáü ÛÁ¼ìí░ìÖÇ Ù¼╝ÙмÿòÖìáü ìØ┤ÙíáìØä ÿåÁÿò┤ Ùà╝ìĞØìØä ìáäÛ░£ÿò£Ùïñ. ìä©Û│äÛ░Ç ÿòİÙéİÙØ╝Ùèö ìú╝ìŞÑìØÇ ìóàÛÁÉìáü ì£äìòêìØ┤ ìòäÙïêÙØ╝ Û│╝ÿòÖìáü Û░ÇìäñìØ┤ÙØ╝Ùèö ìáÉìùÉìä£ ìØ┤ ì▒àìØÇ ÙÅäÙ░£ìáüìØ┤Ùïñ.
ìØ┤Ùş¼ÿò£ Ùà╝ìØİÙèö ìİñÙèİìØİ ìï£ÙîÇìáü ÙğÑÙØ¢Û│╝ÙÅä Ù¼┤Û┤ÇÿòİìğÇ ìòèÙïñ. Û©░ìêáìØÇ ìä©Û│äÙÑ╝ ì┤êìù░Û▓░ ìâüÿâ£Ùí£ ÙğîÙôñìùêìğÇÙğî, ìé¼ÿÜîÙèö ìİñÿŞêÙáñ Ùıö Ùï¿ìáêÙÉİÛ│á ÙÂäìù┤ÙÉİìû┤ ìŞêÙïñ. ìáòì╣İìáü ìûæÛÀ╣ÿÖö, ìâØÿ⣠ì£äÛ©░, ìáä ìğÇÛÁ¼ìáü Û░Éìù╝Ù│æìØİ Û▓¢ÿùİìØÇ ÔÇİÙÂäÙмÙÉ£ ìú╝ì▓┤ÔÇÖÙØ╝Ùèö ÛÀ╝ÙîÇìáü ìáäìá£Û░Ç ÿò£Û│äìùÉ ìØ┤ÙÑ┤ÙáÇìØîìØä Ù│┤ìù¼ìñÇÙïñ. Ùğîìò¢ ìÜ░ÙмÛ░Ç ÛÀ╝Ù│©ìáüì£╝Ùí£ ìù░Û▓░ÙÉ£ ìí┤ìŞ¼ÙØ╝Ù®┤, ì▒àìŞäÛ│╝ ì£ñÙмìØİ Û©░ìñÇ ÙİÉÿò£ Ùï¼ÙØ╝ìğê ìêİÙ░ûìùÉ ìùåÙïñ. ÿÖİÛ▓¢ ÿîîÛ┤┤Ùèö ìÖ©ÙÂÇìØİ Ù¼©ìá£Û░Ç ìòäÙïêÙØ╝ ìŞÉÛ©░ ÿîîÛ┤┤Û░Ç ÙÉİÛ│á, ÿâÇìØ©ìØİ Û│áÿåÁìØÇ Ùé¿ìØİ ìØ╝ìØ┤ ìòäÙïêÙïñ. ÿÄİìèñìØİ Ùà╝ìğÇÙèö Ù¼╝ÙмÿòÖìØä Ùäİìû┤ ì£ñÙмÿòÖìØİ ìğÇÿÅëì£╝Ùí£ ÿÖòìŞÑÙÉ£Ùïñ.
ÛÀ©Ùş¼Ùéİ ìØ┤ ì▒àìØÇ ìë¢Û▓î Û▓░ÙíáìØä Û░òìÜöÿòİìğÇ ìòèÙèöÙïñ. ìä©Û│äÛ░Ç ÿòİÙéİÙØ╝Ùèö Û░ÇìäñìØÇ Ùğñÿİ╣ìáüìØ┤ìğÇÙğî, ÛÀ©Û▓âìØ┤ Û│ğ Ù¬¿Ùôá ì░¿ìØ┤ÙÑ╝ ìğÇìÜ░Ùèö ÙÅÖìØ╝ìä▒ìØİ Ùà╝ÙмÙí£ ìØ┤ìû┤ìá©ìä£Ùèö ìòê ÙÉ£Ùïñ. ì░¿ìØ┤ìÖÇ Û░£Ù│äìä▒ìØÇ ìù¼ìáäÿŞê ìÜ░ÙмìØİ Û▓¢ÿùİ ìä©Û│äìùÉìä£ ìñæìÜöÿò£ ìØİÙ»©ÙÑ╝ Û░ûÙèöÙïñ. Ù¼©ìá£Ùèö ÔÇİÙÂäÙмÔÇÖìÖÇ ÔÇİìù░Û▓░ÔÇÖìØä ìû┤Ùû╗Û▓î ÿò¿Û╗İ ìé¼ì£áÿòá Û▓âìØ©Û░ÇìØ┤Ùïñ. ÿÄİìèñìØİ ìŞæìùàìØÇ ÿåÁÿò®ìØä ìäáìû©ÿòİÛ©░Ù│┤Ùïñ, ÿåÁÿò®ìØä ìé¼ì£áÿòá ìêİ ìŞêÙèö ìØ┤Ùíáìáü ÿåáÙîÇÙÑ╝ ìá£ìï£ÿò£ÙïñÙèö Ùı░ ìØİìØİÛ░Ç ìŞêÙïñ.
ìØ┤ ì▒àìØä ìØ¢Ùèö ìØ╝ìØÇ Ù¼╝ÙмÿòÖ ÛÁÉìûæìØä ìîôÙèö ì░¿ìøÉìØä Ùäİìû┤, ìŞÉìïáìØİ ìí┤ìŞ¼ Ù░®ìïØìØä ìŞ¼Û│áÿòİÙèö Û│╝ìáòìØ┤ ÙÉá ìêİ ìŞêÙïñ. ÙéİÙèö Û│áÙĞ¢ÙÉ£ Û░£ìØ©ìØ©Û░Ç, ìòäÙïêÙ®┤ Û▒░ÙîÇÿò£ ìÜ░ìú╝ìØİ ÿò£ ÿæ£ÿİäìØ©Û░Ç. Ùğîìò¢ ÿøäìŞÉÙØ╝Ù®┤, ÙéİìØİ ìäáÿâØÛ│╝ ÿâ£ÙÅäÙèö ìû┤Ùûñ ì▒àìŞäìØä ÙÅÖÙ░İÿòİÙèöÛ░Ç. Û▓®Ù│ÇìØİ ìï£ÙîÇÙÑ╝ ìé┤ìòäÛ░ÇÙèö ìÜ░ÙмìùÉÛ▓î ÿòäìÜöÿò£ Û▓âìØÇ ÿÖòìïáìØ┤ ìòäÙïêÙØ╝, Ùıö ÙäôìØÇ ÿïÇìùÉìä£ ìŞÉìïáìØä Ù░öÙØ╝Ù│┤Ùèö ìï£Û░üìØ╝ìğÇÙÅä Ù¬¿ÙÑ©Ùïñ.
ìù░Û▓░ ÙÅàìä£Ùí£Ùèö ÙÂÇÙÂäÛ│╝ ìáäì▓┤ÙÑ╝ ÛÂîÿò£Ùïñ. ÿİäÙîÇ Ù¼╝ÙмÿòÖìØİ ÿİòìä▒Û│╝ ì▓áÿòÖìáü ÿò¿ìØİÙÑ╝ ÿâÉìâëÿò£ ìØ┤ ì▒àìØÇ Û│╝ÿòÖìØ┤ ìä©Û│äÛ┤ÇìØä ìû┤Ùû╗Û▓î Ù░öÛ¥©ìû┤ìÖöÙèöìğÇ Ù│┤ìù¼ìñÇÙïñ. ÙİÉÿò£ ìùöÙô£ ìİñÙ©î ÿâÇìŞäìØÇ ìï£Û░ä Û░£ÙàÉìØä ìŞ¼ÿò┤ìäØÿòİÙ®░ ìí┤ìŞ¼ìØİ ÛÀ╝Ù│© ÛÁ¼ìí░ÙÑ╝ ìğêÙ¼©ÿò£Ùïñ. ìØ┤ÙôñÛ│╝ ÿò¿Û╗İ ìØ¢ìØä Ùòî, ÔÇİÿòİÙéİìØİ ìä©Û│äÔÇÖÙØ╝Ùèö Ù¼©ìá£ìØİìïØìØÇ Ù│┤Ùïñ ìŞàì▓┤ìáüì£╝Ùí£ Ùô£Ùş¼Ùé£Ùïñ.
Û│╝ÿòÖìØÇ ìáÉìáÉ Ùıö ìä©Ù░Çÿò┤ìğÇÛ│á, ìØ©Û░äìØİ ìéÂìØÇ ìáÉìáÉ Ùıö ÿîîÿÄ©ÿÖöÙÉ£Ùïñ. ÛÀ© ìé¼ìØ┤ìùÉìä£ ìÜ░ÙмÙèö Ùïñìï£ Ù¼╗Û▓î ÙÉ£Ùïñ. Ù¬¿Ùôá Û▓âìØÇ ìáòÙğÉÙí£ ÿòİÙéİìØ©Û░Ç. ìØ┤ ìğêÙ¼©ìØÇ Ùï¿ìê£ÿò£ ÿİòìØ┤ìâüÿòÖìáü ÿİ©Û©░ìï¼ìØ┤ ìòäÙïêÙØ╝, ìÜ░ÙмìØİ ìéÂìØİ Ù░®ÿûÑìØä Û░ÇÙèáÿòİÙèö Ùéİì╣¿Ù░İìØ┤ ÙÉá ìêİÙÅä ìŞêÙïñ. ÿÖ®Û©êÙÅàìä£ÿü┤Ùş¢ìØÇ ìØ┤ì▓İÙş╝ ìï£ÙîÇìØİ ìáäÿÖİÛ©░ìùÉ ìé¼ì£áìØİ ìóîÿæ£ÙÑ╝ ÙäôÿİÇìú╝Ùèö ì▒àÙôñìØä ÿò¿Û╗İ ìØ¢ÙèöÙïñ. ìä©Û│äÙÑ╝ Ùïñìï£ Ù¼Âìû┤ ìé¼ì£áÿòİÙèö Û▓¢ÿùİìùÉ Û┤Çìï¼ìØ┤ ìŞêÙïñÙ®┤, ìí░ìÜ®ÿŞê ÿò£ ìŞÉÙмÙÑ╝ Ùé┤ìû┤ÙæÉìû┤ÙÅä ìóïÛ▓áÙï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