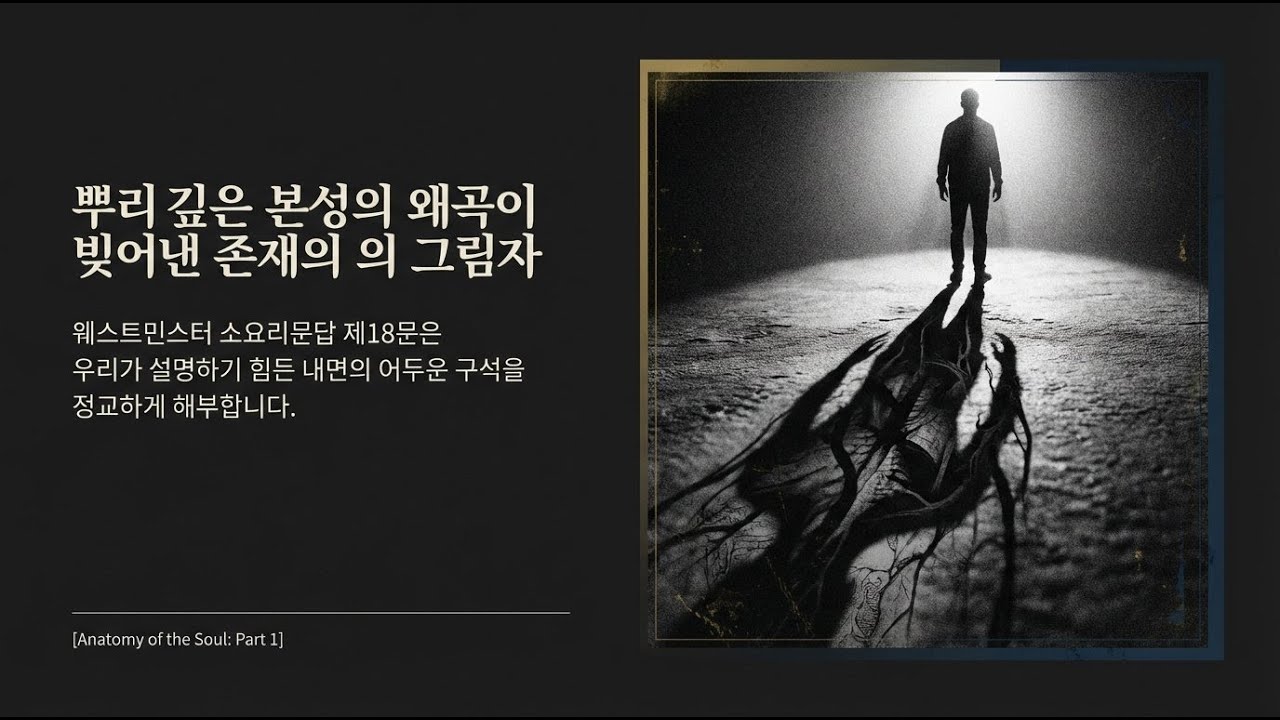м•„лӮҳлҸҢлЈЁ нҶөмӢ мӮ¬м—җ мқҳн•ҳл©ҙ, мөңк·ј мң лҹҪ мқҳнҡҢлҠ” л§қлӘ… мӢ мІӯ м Ҳм°ЁлҘј мӢ мҶҚн•ҳкІҢ мІҳлҰ¬н•ҳкё° мң„н•ҙ 'м•Ҳм „н•ң мӣҗмІңкөӯ' лӘ…лӢЁмқ„ лҸ„мһ…н•ҳлҠ” мғҲлЎңмҡҙ мқҙлҜј к·ңм ң лІ•м•Ҳмқ„ к°ҖкІ°н–ҲлӢӨ. мқҙ лІ•м•ҲмқҖ л°©кёҖлқјлҚ°мӢң, мқёлҸ„, лӘЁлЎңмҪ” л“ұмқ„ нҸ¬н•Ён•ң нҠ№м • көӯк°Җ м¶ңмӢ мқҙлӮҳ EU нӣ„ліҙкөӯ мӢңлҜјл“Өмқҳ мӢ мІӯм„ңлҘј мҡ°м„ мңјлЎң кІҖнҶ н•ҳм—¬ л¶Җм ҒкІ©мһҗлҘј л№ лҘҙкІҢ к°Җл ӨлӮҙлҠ” кІғмқ„ лӘ©н‘ңлЎң н•ңлӢӨ.
нҠ№нһҲ, мӢ мІӯмһҗк°Җ н•ҙлӢ№ көӯк°Җм—җм„ң л°•н•ҙлҘј л°ӣмқ„ мң„н—ҳмқҙ мһҲлӢӨлҠ” мӮ¬мӢӨмқ„ м§Ғм ‘ мһ…мҰқн•ҙм•ј н•ҳл©°, нҠ№м • м—°кі к°Җ мһҲлҠ” м ң3көӯмңјлЎңмқҳ мҶЎнҷҳ м Ҳм°ЁлҸ„ к°„мҶҢнҷ”лҗ м „л§қмқҙлӢӨ. м§Җм§Җмһҗл“ӨмқҖ мқҙ мЎ°м№ҳк°Җ мқҙлҜј н–үм •мқҳ нҡЁмңЁм„ұмқ„ лҶ’мқј кІғмқҙлқј кё°лҢҖн•ҳлҠ” л°ҳл©ҙ, мқёк¶Ң лӢЁмІҙл“ӨмқҖ к°ңлі„ мӢ¬мӮ¬мқҳ кіөм •м„ұмқҙ нӣјмҶҗлҗҳм–ҙ ліҙнҳёк°Җ н•„мҡ”н•ң мӮ¬лһҢл“Өмқҙ мң„н—ҳм—җ мІҳн• мҲҳ мһҲлӢӨкі кІҪкі н•ңлӢӨ. мқҙлІҲ н•ҙлӢ№ к·ңм •мқҙ мөңмў… мӢңн–үлҗҳл Өл©ҙ н–Ҙнӣ„ мң лҹҪ мқҙмӮ¬нҡҢмқҳ кіөмӢқ мҠ№мқё м Ҳм°ЁлҘј кұ°міҗм•ј н•ңлӢӨ.
лғүм •н•ң нҡЁмңЁмқҳ м„ұлІҪ, мң лҹҪмқҙ м§ҖмӣҢлІ„лҰ° вҖҳмқҙмӣғвҖҷмқҳ м–јкөҙ
2026л…„ 2мӣ” 10мқј, мң лҹҪ м—°н•©(EU)мқҳ мӢ¬мһҘл¶Җм—җм„ңлҠ” мқёлҘҳм• мқҳ мғҒ징мңјлЎң м—¬кІЁмЎҢлҚҳ вҖҳмқёлҸ„мЈјмқҳм Ғ ліҙнҳёвҖҷмқҳ л“ұл¶Ҳмқҙ нқ¬лҜён•ҙм§ҖлҠ” мҶҢлҰ¬к°Җ л“Өл ёлӢӨ. мң лҹҪ мқҳнҡҢ(AP)лҠ” л§қлӘ… м Ҳм°ЁлҘј нҡҚкё°м ҒмңјлЎң лӢЁм¶•н•ҳкі көӯкІҪ кҙҖлҰ¬лҘј к°•нҷ”н•ҳлҠ” мғҲлЎңмҡҙ мқҙлҜј к·ңм •мқ„ нҶөкіјмӢңмј°лӢӨ. м°¬м„ұ 408н‘ңлқјлҠ” мҲ«мһҗлҠ” м§Ҳм„ңмҷҖ нҶөм ңлқјлҠ” лӘ…분 м•„лһҳ вҖҳм•Ҳм „вҖҷмқ„ м •мқҳн•ҳл ӨлҠ” к¶Ңл Ҙмқҳ мқҳм§ҖлҘј ліҙм—¬мӨҖлӢӨ. к·ёлҹ¬лӮҳ к·ё мқҙл©ҙм—җлҠ” 184н‘ңмқҳ л°ҳлҢҖмҷҖ 60н‘ңмқҳ л¬ҙкұ°мҡҙ м№Ёл¬өмқҙ нқҗлҘҙкі мһҲлӢӨ. мқҙ м№Ёл¬өмқҖ нҡЁмңЁм„ұмқҙлқјлҠ” м№јлӮ м—җ мһҳл Ө лӮҳк°Ҳ лҲ„кө°к°Җмқҳ мғқмЎҙк¶Ңм—җ лҢҖн•ң мң лҹҪмқҳ л§Ҳм§Җл§ү м–‘мӢ¬мқҙмһҗ 비лӘ…мқҙлӢӨ.
мқҙлІҲ к·ңм •мқҳ к°ҖмһҘ к°Җнҳ№н•ң м§Җм җмқҖ л§қлӘ… мӢ мІӯмһҗм—җкІҢ м§ҖмӣҢ진 вҖҳмһ…мҰқмұ…мһ„вҖҷмқҙлӢӨ. кіјкұ°м—җлҠ” көӯк°Җк°Җ мӢ мІӯмһҗмқҳ мғҒмІҳлҘј лЁјм Җ мӮҙн”јлҠ” мөңмҶҢн•ңмқҳ мҳЁкё°к°Җ мһҲм—ҲлӢӨ. н•ҳм§Җл§Ң мқҙм ң м „мҹҒн„°мҷҖ нғ„м••мқҳ нҳ„мһҘм—җм„ң л§ЁлӘёмңјлЎң нғҲм¶ңн•ң мқҙл“Өмқҙ лӮҜм„ нғҖкөӯмқҳ мұ…л¬ҙмһҗ м•һм—җм„ң мһҗмӢ мқҙ ліёкөӯмңјлЎң лҸҢм•„к°”мқ„ л•Ң мЈҪмқҢм—җ мқҙлҘј мҲҳ мһҲлӢӨлҠ” вҖҳк°қкҙҖм Ғ мҰқкұ°вҖҷлҘј мҠӨмҠӨлЎң лӮҙлҶ“м•„м•ј н•ңлӢӨ. мҰқлӘ…н• мҲҳ м—ҶлҠ” кі нҶөмқҖ мЎҙмһ¬н•ҳм§Җ м•ҠлҠ” кі нҶөмңјлЎң к°„мЈјлҗҳлҠ” мӢңлҢҖк°Җ мҳЁ кІғмқҙлӢӨ.
нҠ№нһҲ, вҖҳм•Ҳм „н•ң м¶ңмӢ көӯк°ҖвҖҷ лҰ¬мҠӨнҠёмқҳ кіөмӢқнҷ”лҠ” н–үм •м Ғ нҺёмқҳмЈјмқҳмқҳ м •м җмқ„ ліҙм—¬мӨҖлӢӨ. л°©кёҖлқјлҚ°мӢң, мқҙ집нҠё, нҠҖлӢҲм§Җ л“ұ мқёк¶Ң мң лҰ°мқҳ ліҙкі к°Җ лҒҠмқҙм§Җ м•ҠлҠ” көӯк°Җл“Өмқҙ лӢЁм§Җ вҖҳн–үм •мғҒмқҳ м•Ҳм „м§ҖлҢҖвҖҷлЎң 묶мҳҖлӢӨ. мқҙ лӘ…лӢЁм—җ нҸ¬н•Ёлҗң көӯк°Җ м¶ңмӢ мһҗл“ӨмқҖ мӮ¬мӢӨмғҒ к°ңлі„м Ғмқё мӮ¬м—°мқ„ кІҖнҶ л°ӣкё°лҸ„ м „м—җ вҖҳк°ҖмҶҚ мӢ¬мӮ¬вҖҷлқјлҠ” мқҙлҰ„мқҳ кёүн–үм—ҙм°ЁлҘј нғҖкі ліёкөӯмңјлЎң мҶЎнҷҳлҗ мІҳм§Җм—җ лҶ“мҳҖлӢӨ. көӯк°Җк°Җ м •н•ң вҖҳм•Ҳм „вҖҷмқҙлқјлҠ” лӢЁм–ҙк°Җ лҲ„кө°к°Җм—җкІҢлҠ” мӮ¬нҳ• м„ кі к°Җ лҗ мҲҳ мһҲлӢӨлҠ” нҳ„мӢӨмқ„ м •м№ҳлҠ” мҷёл©ҙн•ҳкі мһҲлӢӨ.
лҚ”мҡұ мҡ°л ӨмҠӨлҹ¬мҡҙ лҢҖлӘ©мқҖ вҖҳкөӯкІҪмқҳ мҷёмЈјнҷ”вҖҷлӢӨ. EUлҠ” нӣ„ліҙкөӯмқҙлӮҳ кІҪмң м§ҖлҘј вҖҳмҷ„충 м§ҖлҢҖвҖҷлЎң мӮјм•„ л§қлӘ…к°қмқҳ м ‘к·јмқ„ мӣҗмІң лҙүмҮ„н•ҳл Ө н•ңлӢӨ. к°ҖмЎұмқҙ мһҲкұ°лӮҳ м–ём–ҙм Ғ м—°кІ°кі лҰ¬л§Ң мһҲм–ҙлҸ„ м ң3көӯмңјлЎң л°Җм–ҙлӮј мҲҳ мһҲлҠ” мқҙ к·ңм •мқҖ, мң лҹҪмқҙ м§Җкі мһҲлҚҳ мқёк¶Ңмқҳ м§җмқ„ к°ҖлӮңн•ң мЈјліҖкөӯм—җ л– л„ҳкё°лҠ” н–үнғңлӢӨ. мқҙлҠ” кІ°көӯ м§ҖмӨ‘н•ҙлҘј кұ°лҢҖн•ң л¬ҙлҚӨмңјлЎң л§Ңл“ңлҠ” мң„н—ҳн•ң н•ӯлЎңлҘј лҚ”мҡұ мқҢм§ҖлЎң мҲЁм–ҙл“ӨкІҢ н• лҝҗмқҙлӢӨ.
мҡ°лҰ¬лҠ” л¬јм–ҙм•ј н•ңлӢӨ. кіјм—° мҡ°лҰ¬к°Җ лҲ„лҰ¬лҠ” мқҙ нҸүмҳЁн•ң мқјмғҒмқҙ нғҖмқёмқҳ м Ҳк·ңлҘј л§үм•„ м„ёмҡҙ м„ұлІҪ мң„м—җм„ңл§Ң к°ҖлҠҘн•ң кІғмқёк°Җ. нҡЁмңЁм„ұмқҙлқјлҠ” мқҙлҰ„мқҳ м§ҖлҸ„к°Җ лҲ„кө°к°Җмқҳ л§Ҳм§Җл§ү мғқмЎҙмӨ„мқ„ лҒҠм–ҙлӮҙкі мһҲлӢӨл©ҙ, к·ё м§ҖлҸ„лҠ” мқҙлҜё л°©н–Ҙмқ„ мһғмқҖ кІғмқҙлӢӨ. мң лҹҪмқҙ лӢӨмӢң к·ёлҰ° мқҙ м°Ёк°Җмҡҙ м§ҖлҸ„лҠ” мҡ°лҰ¬м—җкІҢ вҖҳм•Ҳм „вҖҷмқҳ м§„м •н•ң мқҳлҜёк°Җ л¬ҙм—Үмқём§Җ, к·ёлҰ¬кі мҡ°лҰ¬к°Җ мғҒмӢӨн•ҙ к°ҖлҠ” вҖҳкіөк°җмқҳ мҳҒнҶ вҖҷк°Җ м–ҙл””мқём§Җ лјҲм•„н”Ҳ м§Ҳл¬ёмқ„ лҚҳм§Җкі мһҲ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