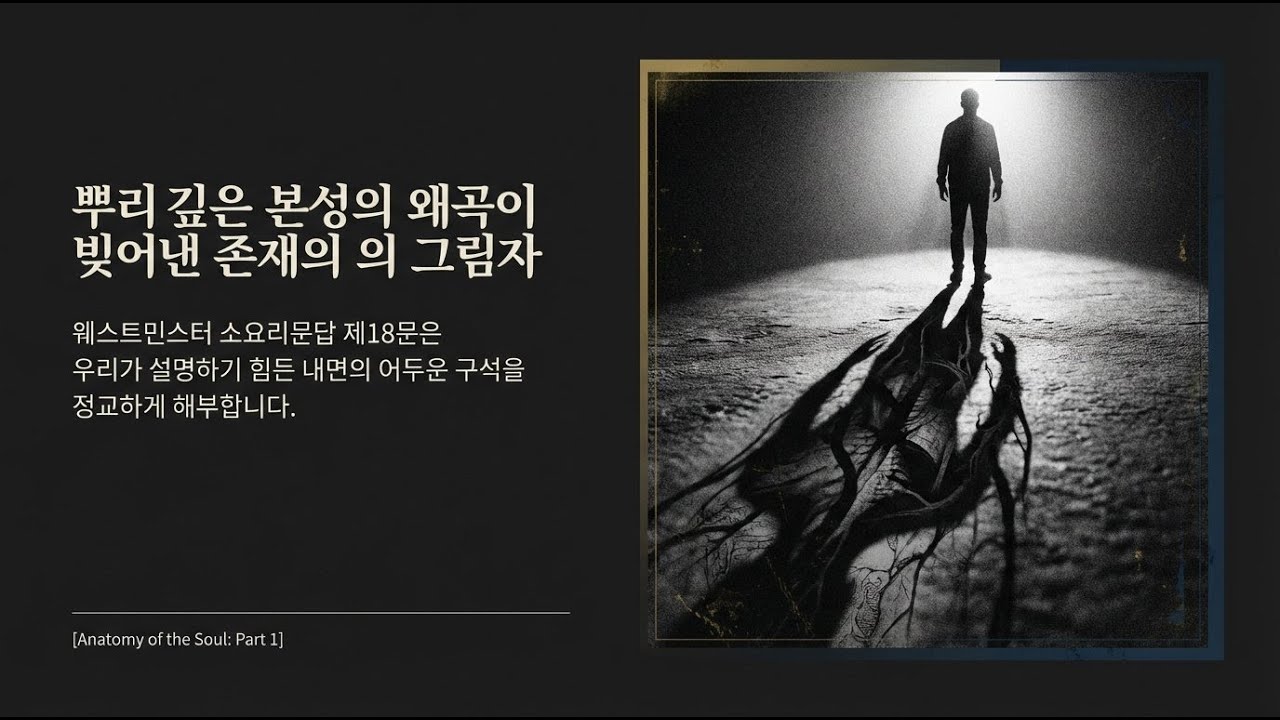도심 접근성, 깔끔한 외관, 비교적 낮은 초기 비용. 오피스텔은 사회 초년생과 1인 가구에게 “지금 가능한 선택지”처럼 보이곤 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진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면서도 주택이 아닌 성격이 섞여 있고,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다. 계약 전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오피스텔 전세는 구조적으로 ‘현금흐름이 끊기는 거래’라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본질적으로 임대 수익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다.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 유지비를 충당하고 남는 차익으로 수익을 만든다.
그런데 전세가 들어오면 매달 들어와야 할 현금흐름이 사라지고, 대신 만기 때 되돌려줘야 할 목돈만 남는다.
보증금은 이익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붙는 부채에 가깝다.
임대인의 자금 여력과 관리 능력이 탄탄하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꼬일 가능성이 커진다.
오피스텔 전세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이런 경제적 역학이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아파텔이라도 ‘아파트의 규칙’로 살 수 없다는 점이다.
방 수와 구조가 비슷하더라도 법적 성격이 다르면 생활 체감이 확 달라진다.
흔히 나타나는 불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체감 면적이 작다.
발코니 같은 여유 공간이 사실상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보이는 면적이 전부”로 느껴지기 쉽다.
채광과 통풍이 불리할 수 있다.
업무시설 성격의 건축 기준은 공동주택과 결이 달라, 단지 배치가 촘촘해지는 사례가 생긴다.
층간 소음 대응이 약해질 수 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절차나 기대할 수 있는 공적 조정 장치가 아파트와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관리비가 예상보다 뛴다.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용면적을 포함한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흔해, 같은 평수 감각으로 비교하면 착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처럼 공개와 감사가 촘촘하지 않은 구간이 있어,
집합건물법 적용 환경에서는 내역 확인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다.
커뮤니티와 편의시설이 비어 있을 수 있다.
의무 설치 시설의 폭이 다르고, 입주민 구성도 단기 임차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생활 공동체가 느슨해지기 쉽다.
실제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에서는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전월세 비중이 82.9%이고 자가 비중은 14.4%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중도 80.7%로 집계됐다.

주차 스트레스가 잦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부족하거나 기계식 주차 비중이 높아 일상이 불편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요약하면 “사는 건 불편한데, 드는 돈은 줄지 않는다”가 오피스텔 실거주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결론이었다.
셋째, 세금에서 ‘주택’ 판정이 상황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주거, 업무)에 따라 세금 분류가 갈라지며, 그 결과가 다음 의사결정에 연쇄 영향을 준다.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지점은 취득 단계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세율과 적용 범위는 개인의 보유 주택 수, 지역, 법인 여부 등 변수가 얽혀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했다.
더 큰 함정은 “오피스텔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살 때” 튀어나오는 경우다.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인 경우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안내가 반복된다.
이 조건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오피스텔은 “사기 전에는 단순해 보이고, 산 뒤에는 복잡해지는” 세금 구조를 갖고 있었다.
넷째, 그럼에도 오피스텔 수요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개인 취향이 아니라 인구 구조에 가깝다.
통계청 자료에서는 2024년 1인 가구가 80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한 것으로 정리돼 있다.
3~4인 가구 중심의 주택 공급 구조에서, 도심의 소형 주거 수요를 촘촘히 흡수하는 공간이 필요해졌고
오피스텔이 그 빈틈을 메워 왔다.
즉 오피스텔은 단점이 많아도, 수요가 존재하는 한 형태를 바꾸며 존속하는 상품이 됐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오피스텔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실거주인지 투자 목적인지, 주차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향후 주택 추가 매입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졌다.
계약서는 마지막에 쓰는 종이가 아니라, 처음에 깔아야 할 안전장치였다.
요약하자면
오피스텔 계약 리스크는 전세 구조의 취약한 현금흐름, 아파트와 다른 생활 규칙,
관리비와 주차의 체감 비용, 그리고 조건부로 바뀌는 세금 판정에서 커졌다.
이 네 가지를 계약 전에 점검하면 보증금 위험을 줄이고, 고정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며,
향후 주택 매입 계획까지 포함한 ‘총비용’ 관점의 선택이 가능해졌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편리함과 불편함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상품이다.
도심의 시간을 사는 대신 면적과 커뮤니티, 관리비, 세금 변수를 떠안는 구조가 됐다.
계약을 고민한다면 “가격”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했다.
구조를 이해한 선택만이 기회가 됐고, 이해 없이 서명한 계약은 함정이 되기 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