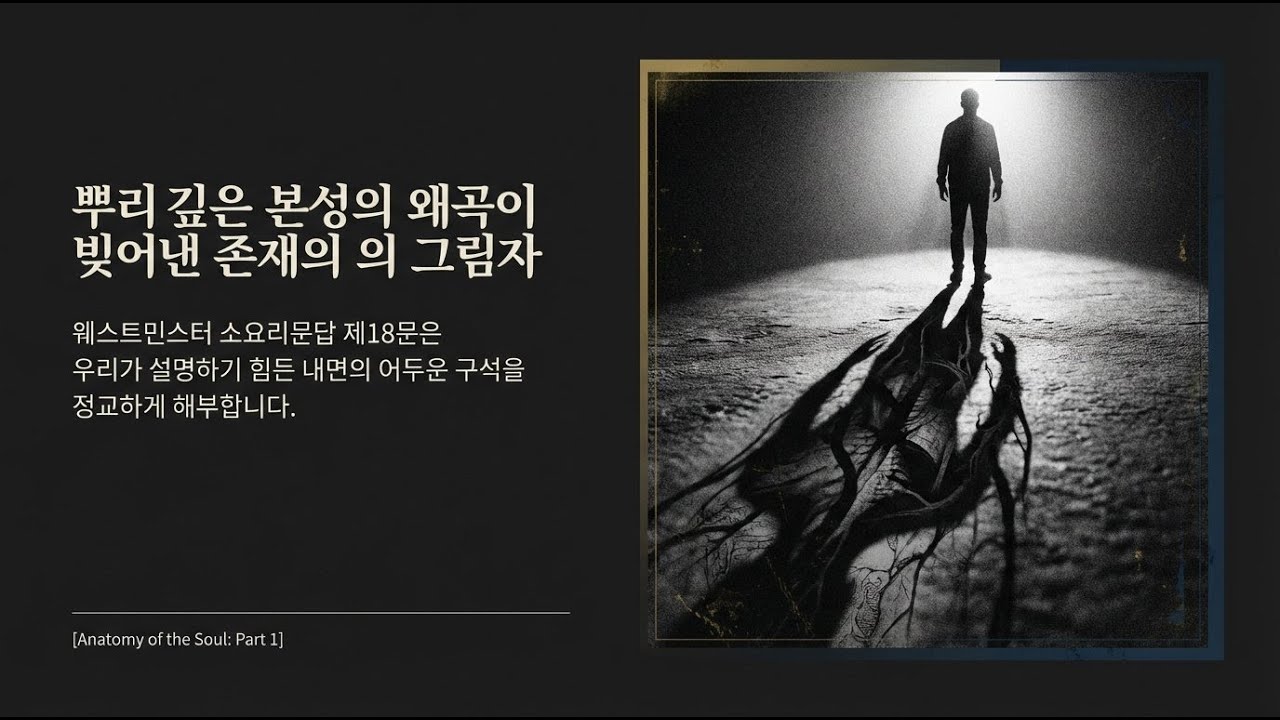“프로축구 선수라는 이름으로 그라운드에 서 있지만, 삶의 무게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가운데 K리그 선수 최저 연봉 2,700만 원을 두고 선수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이 수치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협 이근호 회장은 “현재 K리그 최저 연봉은 2,700만 원으로, 2024년 기준 최저 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한 약 2,473만 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며 “프로선수로서 훈련과 경기, 자기 관리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생계형 연봉”이라고 토로했다.
현장의 체감 온도는 더 낮다. 시즌 내내 부상 위험과 성적 압박에 시달리며 짧은 선수 생명을 견뎌야 하는 신인·저연차 선수들에게 이 금액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타 종목과의 격차는 선수들에게 상대적 박탈 감을 안겨주고 있다 남자 프로농구(KBL)의 최저 연봉은 4,200만 원, 남자 프로배구(V리그)는 4,000만 원이다. 최근 “낮다”는 논란이 있었던 프로야구(KBO)조차 3,0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3,300만 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
이근호 회장은 “올해 K리그는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최저임금과 다를 바 없는 연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선수들이 있다”며 “치솟는 물가와 짧은 선수 생명을 고려할 때, 2,700만 원으로 과연 프로로서의 생계 유지와 동기부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도 KBO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KBO는 최저 연봉 인상과 함께 엔트리 확대(65명→68명)를 통해 선수들의 일자리 자체를 늘렸다”라며 “이는 선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리그 사이즈 확대’와도 같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선수들은 단순한 연봉 인상을 넘어, 프로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망주 이탈과 선수층 붕괴는 결국 리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선수협은 이번 KBO의 결정을 기준점 삼아, 2026년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서 최저 연봉 현실화와 등록 선수 정원 확대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선수들은 “이 문제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K리그 전체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